Yuk Hui, Art and Cosmotechnic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21, Chap. 1_전문 번역
*주석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 >'는 원문 페이지수. '[ ]' 는 역자 보충입니다.
1장 세계와 대지
<67>§7. 철학의 종말 이후 예술
헤겔이 『미학 강의』에서 예술의 종말은 절대자(the Absolute)를 향한 정신의 자기 인식에 필수적인 단계라고 주장한 것은 유명하다. 역사는 선험적 규칙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현상적으로(Schein) 우연적이다. 반면에 역사적 진보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보편성, 즉 절대자를 향해 나아가는 이성의 자율성과 동일시되는 필연성에 의해 동기화되기 때문에 무작위적이지 않다. 고대 그리스에서 예술은 절대자이자 정신의 가장 높은 형태를 대표했지만, 이후 이 관계는 종교에 의해 극복되었다. 예술은 종교의 한 요소로 사용될 수 있지만 - 예를 들어, 아이콘의 상징성 - , 더 이상 절대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대표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신앙심(Andacht)은 절대자와 자유를 추구하는 정신의 더 높은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헤겔은 가장 높은 형태는 더 이상 예술이나 계시된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라고 주장한다. ‘참된 변신론’으로서 철학은 살아있는 개념(Begriff)을 통해 절대 이념을 파악하는 가장 탁월한 양식이다.[1] 헤겔에게 고대 그리스의 예술에서 기독교로, 그리고 계몽주의 이후 철학으로의 전환은 정신(Geist)의 절정에 이르는 이정표이자 이성의 자기 인식과 진리 정복의 여정을 드러낸다.
최고의 소명으로 여겨지는 예술은 우리에게 과거의 일로 남겨졌다. 이에 따라 예술은 그 고유한 진리와 생명을 잃어버렸고, 현실에서 그 이전의 필요성을 유지하며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대신 오히려 우리의 관념 속으로 옮겨졌다.[2]
<68>헤겔은 예술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는 것을 멈추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한 말은 그리스인들에게도 이미 종교가 있었으며, 예술이 기독교에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헤겔 자신의 시대에 위대한 예술 작품이 창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다. 헤겔이 의미하는 바는 예술의 지위가 고대 그리스의 정신적 삶에서의 예술, 특히 비극이 차지했던 위치를 더 이상 얻지는 못했지만 이전 단계의 정신에 대한 증언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3] 헤겔의 변증법, 즉 그의 삼중의 놀이에서 예술, 종교, 철학은 역사 속에서 절대자에 대한 정신적 지식의 세 가지 단계로 제시된다. 여기서는 예술의 외부성(직관과 상상력), 종교적 경험의 내부성(느낌과 표상), 철학 또는 로고스(logos, 순수하고 자유로운 사유)에 따른 대립의 지양이 드러난다.[4]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예술은 종교이자 철학이었지만 기독교의 도래와 함께 예술은 더 이상 정신의 완전한 움직임과 복잡성을 포착하기에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 상징적 단계에서 고전 단계, 그리고 이후 낭만주의 단계에 이르는 예술의 발전은 헤겔의 주장처럼 건축(상징적), 조각(고전주의), 회화, 음악, 시(낭만주의) 등 다양한 예술적 형태로 표현된다. 이러한 예술의 역사는 이데아의 역동성은 물론이고, 그 변증법적 운동에 의해 필요한 추상 형식의 확대와 이데아와 정신의 관계가 점차 쓸모없게 되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헤겔이 인정한 것처럼 예술은 “덧없는 놀이로 사용되어 레크리에이션과 오락을 제공하고, 주변 환경을 장식하고, 삶의 외양에 즐거움을 주고, 예술적 꾸밈을 통해 상이한 사물들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5]는 점에서 계속 존재한다. 하지만 예술과 정신의 관계는 결코 예전의 높은 지위를 되찾지 못할 것이다. 예술 작품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무릎을 꿇지 않는다.”
<69>오늘날 우리 세계의 정신, 특히 종교와 이성의 발전은 예술이 절대자에 대한 지식의 최고의 방식이 되는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예술적 생산과 예술 작품의 특유한 특성은 더 이상 우리의 가장 높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우리는 예술 작품을 신성한 것으로 존경하고 숭배하는 것을 극복했다. 예술 작품이 주는 감동은 보다 성찰적인 것에 속하며, 예술 작품이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는 것은 더 높은 시금석과 다른 시험이 필요하다. 사유와 반성은 순수 예술 위에서 날개를 펼쳤다.[6]
그러나 헤겔을 따라 1831년 베를린에서 그가 죽은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찰해 보면 철학은 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다. 오히려 우리는 헤겔의 동료들로부터 철학의 종말에 대해 오래전부터 들어왔다. 이러한 생각은 특히 1964년 마르틴 하이데거가 「철학의 종말과 사유의 과제」라는 논문에서 발표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것은 1930년대 하이데거 사상의 전환기라고 불리는 시기 이후 그의 사유 초기 단계부터 존재해 왔다.
1966년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하이데거는 철학의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사이버네틱스라는 한 단어로 대답했다. 어떻게 사이버네틱스가 철학의 종말이 될 수 있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철학과는 안전해 보이지만 사이버네틱스라는 학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컴퓨터 과학, 정보 과학, 인공 지능, 그리고 곧 디지털 인문학으로 대체되었다. 시장에서 신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퍼뜨린 니체의 광인이 조롱을 받듯이, 철학의 죽음은 여전히 등록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는 정신이 예술, 종교, 철학의 단계를 거쳐 마침내 사이버네틱스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세계-과정의 절정이자 종착점’과 헤겔의 ‘베를린에서의 자기 존재’가 일치한 이후 엄격한 심문을 요구하면서 예술, 종교, 철학의 헤겔적 삼중의 놀이가 깨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이데거에게 철학의 종말은 주로 두 가지를 의미한다. 우선, 사이버네틱스가 <70>고대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 서양 철학과 형이상학의 과업이었던 것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플라톤의 이데아-아리스토텔레스의 이항대립-기독교의 존재신학-데카르트적 기계론-헤겔의 체계-니체의 힘에의 의지-유기체론/사이버네틱스이다. 완성이란 새로운 과제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그 과제는 서양 형이상학의 정점인 사이버네틱스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이 새로운 과제는 우선 모든 것을 계산 가능성으로 환원하려는 시도(또는 하이데거가 ‘기계화’ 또는 간계Machenschaft라고 부르는 계산가능성Berechenbarkeit, 훗날 악명 높은 『검은 노트』에서 유대인을 가리키는 단어)에 저항하고 끈질긴 휴머니즘과 거리를 두면서 세계를 다시 열어가야 한다.
둘째, 철학의 종말은 기술의 시대로서 서유럽 사고의 보편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하이데거는 1930년대에 이미 기술이 지구의 행성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고, 나중에는 지구가 사이버네틱 시스템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보편화 속에서 지구는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에 인공 행성이 된다.
따라서 19064년 논문에서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철학의 종말은 과학 기술 세계와 이 세계에 적합한 사회 질서의 조작 가능한 배치의 승리로 증명된다. 철학의 종말은 서구 유럽적 사유에 기반한 세계 문명의 시작을 의미한다.[9]
철학의 종말은 기술-과학 시대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세계화된 기술-과학 경쟁에 의해 광범위하게 결정되는 지정학의 징후이기도 하다. <71>철학의 종말 이후를 사유한다는 것은, 만약 이 과제가 여전히 희망적인 과제라면, 사이버네틱스와 현대 지정학을 모두 넘어서는 사유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이데거를 지정학의 사상가로 간주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따라서 유럽 철학의 종말을 선언하고 ‘질문하기가 완전히 부재한 시대’에 예술에 대한 질문의 길을 마련한 하이데거로부터 예술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려 한다.[10] 오늘날 지구공학, 인간 개량, 에코모더니즘 등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찬양하는 기술적 치료법에 의해 질문의 완전한 부재라는 사실이 모호해지고 있다. 유럽 철학의 종말은 포스트 유럽 철학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여기서 ‘포스트’는 ‘반’(anti-)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유로의 필연적 도약이며, 하이데거에게 그것은 존재(Sein)에 관한 사유다. 서구 사유의 역사에서 존재 물음은 폐기되었는데, 이는 서구적 사유가 존재보다 존재자(Seiendes)를 우선시했고, 결과적으로 존재 망각의 역사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이데거의 「예술 작품의 근원」(1935/36) - 예술을 주제로 이 철학자의 드문 글 - 을 철학의 종말 이후 사유의 가능성에 대한 성찰인 『철학에의 기여』(1936-38)와 같이 놓고 읽을 수 있다. 두 글 사이의 밀접성은 그것들이 개략적으로 동시대적 저술 뿐만 아니라 예술과 사유 사이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하이데거의 예술에 대한 질문의 재조명은 부분적으로 철학의 종언 이후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한 가능성이 된다.
하이데거는 1950년대에 쓴 「예술작품의 근원」 발문에서 예술이 더 이상 진리를 발견하는 최고의 수단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 예술의 종말이 온다는 헤겔의 유명한 명제를 인용했다. <72>고대 그리스에서 위대한 예술을 형성한 정신의 자기 탐색은 이미 지나갔다.[11] 하이데거는 헤겔의 평결이 아직 결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예술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즉, 예술의 역할은 정신의 삼항(triadic) 놀이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술은 여전히 정신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예술적 문제로의 회귀는 철학의 종언 이후 새로운 사고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하이데거의 예술철학에 대한 수많은 연구와 달리, 나는 이 장의 중심주제인 하이데거의 탐구를 현대 기술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하이데거의 전략은 고대 그리스에서 예술의 원초적 경험을 다시 다루고 이 경험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암시적으로 묻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의식적으로 정신에 대한 질문을 존재 물음(Seinsfrage)으로 바로 잡음으로써, 정신에 대한 질문을 탈구시킨다.
헤겔의 강의 이래 [...] 우리는 많은 새로운 예술 작품과 예술 운동이 생겨났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헤겔이 이러한 진술에서 건네주는 판결을 회피할 수는 없다. 헤겔은 이러한 가능성을 부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그러나 예술은 여전히 우리의 역사적 실존에 결정적인 진리가 발생하는 데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방식인가, 아니면 예술은 더 이상 이러한 성격을 갖지 않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12]
미국의 철학자 아서 단토(Arthur Danto)는 “하이데거는 한 세기의 예술 혁명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종말 논제가 사실인지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잘못 암시했다”고 주장한다.[13] 단토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예술의 종말이 예술 창작의 종말이 아니라 정신과 예술 사이의 특정한 관계의 종결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지 못했기에 틀렸다는 것이다. 단토에게 예술의 종말은 1964년 4월 앤디 워홀의 <브릴로 박스>(Brillo Boxes)가 전시된 <73>뉴욕시 이스트 74번가의 ‘스테이블 갤러리’에서 발견될 수 있었다. 단토는 (독일 역사가 한스 벨팅Hans Belting을 따라)[14] 예술이 서기 1400년에 시작되어 1960년대에 끝났으며, 이때가 (단토가 탈역사적 예술이라고도 부르는) 개념미술이 현대미술을 종식시킨 역사적 순간이라고 이해한다.[15]
나는 하이데거가 인용된 구절을 주의 깊게 읽었는지 의심스럽다. 헤겔에게 예술에서 종교로, 그리고 철학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정신의 진보를 의미한다면, 하이데거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서양 형이상학의 역사로서 그리스에서 기독교로, 그리고 이후 관념론으로 이어지는 이 ‘진보’다. 하이데거의 판단과 나의 판단이 다르다면, 그것은 또한 존재와 존재자를 유기체론적이고 반성적인 과정의 관점에서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헤겔의 개념이 형이상학의 절정이며, 그가 논리학이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헤겔의 유기체론(organicism)은 생물학에 그 근원을 두고 있지만, 그 전개는 기술-논리적이다. 독일의 헤겔주의자이자 사이버네틱주의자인 고타르트 귄터(Gotthard Günther)는 사이버네틱스를 기계적 의식의 구성을 향해가는 한 단계이자 헤겔적 반성 논리의 수행으로 본다.[16] 귄터는 기계의 진화를 헤겔적 논리를 향한 진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 그의 평가에 따르면, 고전적 기계는 타자 안의 반성(Reflexion in anderes)이고 폰 노이만 기계는 자기 안의 반성(Reflexion in sich)이지만 ‘뇌 기계’는 “헤겔이 대논리에서 말하는 바, 자기와 타자 안 반성의 자기 반성(Reflexion in sich der Reflexion in sich und anderes)이다”[17]라고 한다.
하이데거에게 서양 형이상학의 역사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헤겔에 이르는 존재론의 역사이며, 존재에 대한 망각의 역사, 즉 존재에게 버림받은 역사에 다름 아니다. 서양 형이상학은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신 존재를 변형된 형태로, 속성을 지닌 존재, 존재-신학, <74>분자 구성체, 유기체적 알고리즘 등등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는 과학적 연구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론적 차이이다. 형이상학을 극복한다는 것은 유럽의 현존재(Dasein)를 존재의 질문으로 되돌리는 급진적 개방을 모색하는 것이다. 존재로 돌아간다는 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말한 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의 종말에 직면했을 때 철학이 결정적인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사고의 근거를 다시 마련하는 또 다른 시작을 찾는다는 의미이다.
하이데거의 일반적인 논제와 방법, 즉 그리스어 테크네 개념을 기술이자 예술로 재해석하여 한 걸음 물러서서 보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묻는다. “예술은 여전히 우리의 역사적 실존에 결정적인 진리가 발생하는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방식인가, 아니면 예술은 더 이상 이러한 성격을 갖지 않는가?” 다시 말해, 예술은 현대 기술의 계산적이고 행성적인 방식에 은폐된 진리를 드러낼 수 있을까?[18] 여기서 우리는 하이데거의 질문을 철학의 종언 이후의 사유의 가능성, 즉 그가 ‘다른 시작[der andere Anfang]’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탐색에 대한 초대로 받아들인다.
§8 예술을 통한 또 다른 시작
돌이켜 보면 예술 작품의 근원에 관한 질문은 철학의 종말 이후 이 다른 시작에 대한 탐구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먼저 하이데거 글의 연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예술 작품의 근원」은 1930년대에 쓰여졌고, 「철학의 종말과 사유의 과제」는 1960년대에 쓰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유의 과제는 이미 하이데거의 이른바 전회(Kehre), 즉 1930년대에 일어난 그의 철학의 전환, 즉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서 존재의 진리를 찾는 것으로의 급진적인 전환에 이미 존재한다.[19] 전회는 시간에 대한 해석에 기반한 기초 존재론에서 존재의 문제 또는 존재 망각의 역사(Geschichte der Seinsvergessenheit)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예술 작품의 근원에 대한 탐구가 철학 이후 사유의 문제를 다시 여는 또 다른 시작에 대한 탐구라면, 하이데거의 사유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해명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다. 그 흔적은 하이데거가 1967년 아테네의 미술 아카데미에서 발표한 텍스트인 「예술의 기원과 사유의 결정」(Die Herkunft der Kunst und die Bestimmung des Denkens)과 같은 후기 저작에서처럼 「예술 작품의 근원」에서만큼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을 수도 있고, 많은 저자들이 추측했듯이 폴 세잔과 폴 클레의 작품과의 만남이 후기 예술에 대한 그의 성찰에 영향과 확신을 준 것으로 보이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20]
<76>질문이 부재한 시대에 하이데거의 급진적 물음을 음미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특히 1960년대에 등장한 개념미술 이후 사유의 지형에서 예술의 역할에 대해 성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언뜻 보기에 예술을 통한 이 상이한 출발은 노발리스(Novalis)와 프리드리히 슐레겔(Friedrich Schlegel) 같은 예나 낭만주의자들(Jena Romantics)이 제안한 것, 즉 철학은 무한에 대한 지식의 한계로 인해 예술, 특히 시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인다.[21]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낭만주의자들에게 반철학적 제스처는 예술을 종교에 종속시켜 예술의 자율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어진다.[22] 그러나 하이데거는 ‘신’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기독교 신앙에 의존하지는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하이데거의 「철학의 종말」이 출판된지 거의 60년이 지난 지금, 전례 없는 경제 경쟁과 군사적 팽창 속에서 미국우선주의(Americanism)와 중화미래주의(Sinofuturism)가 지구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바, 이러한 근본적으로 유럽적인 프로젝트가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지정학적 재구성은 하이데거가 1964년에 발표한 인식론적 헤게모니를 바꾸지 않는다. 가까운 미래에 중화미래주의가 미국우선주의를 대체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지구적 기술 결정론에 직면한 우리에게 더 이상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수 없는 서구 형이상학의 실현을 약속할 뿐이며, 이는 인류세, 지구공학, 유전공학, 기술 특이점, 초지능 등의 용어들은 더 이상 심오한 질문을 던질 여지가 없는 자명한 유행어가 되어 간다. 기술 결정론은 무엇보다도 좁은 기술주의에 대한 사고를 포기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기술과 미래에 대한 특정 이해로 제한하는 한편, 그와 동일한 기술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이데거가 처음 알아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서양 사유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성찰에서 나온 것이므로 하이데거와 함께, 그리고 하이데거를 넘어서 사유하기 위해 여전히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왜 예술의 기원에 대한 질문은 하이데거가 ‘철학’ 대신에 ‘사유’라고 부르는 또 다른 시작을 요구하는가? 하이데거는 기술 과학 세계의 파국적 생성에 대항하는 구원의 힘을 예술에서 찾고 있는 것인가? 하이데거는 예술에서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으며, 이것이 기술의 문제를 밝힐 수 있다고 보았다. 철학의 종말은 다른 몸짓으로 예술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다. 예술은 이러한 목적을 넘어서는 사고와 기술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남아 있다. 하이데거는 예술을 통해 테크네의 문제를 재개념화하고자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하이데거는 미술 전문가가 아니었고 그의 주요 대상은 미술사가 아니라 예술과 기술을 모두 지칭하는 그리스어 technē의 의미에서의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의 「예술작품의 기원」을 미술사와 관련하여 읽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예술과 기술의 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만약 우리 시대에 기술이 예술 제작의 주요 매체가 되었다고 하면, 예술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진다. 부분적으로는 학제 간 융합이라는 피상적인 개념과 학계의 민간 자금 확보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오늘날 산업 제품의 마케팅에 예술과 디자인이 점점 더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따르면 이러한 구분은 시효가 지난 것이 된다.
technē와 관련하여 유럽의 언어와 사유로 예술을 재해석한다는 것은 기술 문제에 대한 어떤 반성을 함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 기술(technē)이 예술(technē)의 주요 매체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대 기술의 본질이 더 이상 그리스어의 technē와 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 문장은 무의미하다. 하이데거는 1949년 브레멘 강연 <닦달>(틀짓기, Gestell)에서 현대 기술의 본질은 기술적이지 않으며, 그리스어 테크네에 내포된 poiesis 또는 산출(Hervorbringen)이 아니라 닦달(Gestell)이라고 주장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현대 기술은 철학의 종말을 알리는 징표이기도 하며, 실제로 서양 형이상학의 실현, 즉 성취와 종말이라는 두 가지 의미에서 그것의 실현이기도 하다.
<78>하이데거는 1935-36년 동안, 「예술 작품의 근원」에서 이미 닦달 개념을 언급했는데, 브레멘 강연이 「기술에 관한 질문」으로 1953년에 출판된 이후에야 비로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나는 하이데거의 사상에서 예술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하이데거가 기술이자 예술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살려서 technē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기술에 관해 질문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술과의 자유로운 관계를 준비해야 한다. 기술의 본질을 향해 우리 인간 존재를 열어준다면, 그 관계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우리가 이 본질에 응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 내에서 기술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23]
기술과의 자유로운 관계를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중의 어떤 구절에서 우리는 “인간은 운명의 영역에 속하는 한에서만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24]라는 말을 읽는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 비극에서처럼 운명을 맹목적인 연속성이 아니라 현재 상황의 변화를 통해 긍정함으로써만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는 뜻에서 운명에 대한 긍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장의 뒷부분에서 현대 기술과 존재의 관계에 대해 다룰 때 이 비극적 태도에 대해 다시 살펴볼 것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예술과 기술 사이에는 그 어떤 차이도 없었다고 하이데거는 말했다. 예술과 기술은 인식론적이고 방법론적인 격절(rupture)을 특징으로 하는 초기 근대에 근접하는 역사적 순간 이후 서로 분리되었다. 하이데거의 근대성 비판은 근본적으로 더 이상 철학이 아닌, 사유라는 또 다른 시작을 통해 근대성을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79>그렇다면 기술이 글쓰기부터 요리, 운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술에 대한 질문에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러한 복수성과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철학자들은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일반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예외에 의해 즉시 도전받게 된다. 하이데거의 접근 방식은 기술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지만, 인류학적 또는 공리주의적 의미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이 기술의 용도에 대해 관심을 갖는 지점에서, 인류학자는 기술의 민족지학적 가치에 관심을 가진다. 우리는 기술의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기술의 본질은 나무를 나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나무의 ‘나무임’(treeness)과 같다. 인류학적 질문이 아니라 존재론적 질문이라면 어떻게 답할 수 있는가? 여기서 하이데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II, 3)과 『형이상학』(V, 2)에 나오는 네 가지 원인을 언급한다. 원인(αἰτία)은 법률적 의미에서 ‘~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죄’를 의미하기도 한다. 독일어 Schuld로 번역하면 ‘빚’을 의미는 것이기도 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인, 질료인, 운동인, 목적인 네 가지 원인을 제시했다. 하이데거는 이 네 가지 원인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인 운동인에 대해 생각하라고 권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운동인은 은성배를 만든 은세공인과 같은 어떤 인물이 아니라 다른 모든 원인을 하나로 모으는 원인, 즉 로고스(logos)이다.
은세공인은 앞서 언급한 응답하고 빚지는 세 가지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한데 모은다. 신중하게 고려하다[überlegen]는 그리스어 legein, logos이다. Legein은 apophainesthai, 즉 ‘앞에 내세우다’에 어원이 있다.[25]
Aitia는 ‘빚을 지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이 빚은 하이데거가 말한 대로 유도하는 것, 즉 촉진-하는-것(ver-an-lassen)이다. 여기서 Veranlassen은 네 가지 원인으로 구성된 전체로서의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 다음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80>그렇다면 활동을 야기하는 네 가지 방법의 통일된 움직임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것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한다. 따라서 그것들은 전면에 나서는 것을 가져옮으로써 통일적으로 지배된다. 플라톤은 『향연』의 한 문장(205b)에서 이 가져옴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현존하지 않는 것에서 현전으로 넘어와 존재로 나아가는 모든 경우는 포이에시스(poiēsis)이며, 전면-에-나섬[낳음, Her-vor-bringen]이다”[26].
그리스어로 poiesis는 ‘낳다’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엇이 생겨나는가? 종교 의식에 사용되는 은성배와 같은 물건인가? 그렇다면 은으로 성배를 만드는 것은 아직 완전히 철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생산주의적 개념(마이클 짐머만Michael Zimmerman의 의미에서)은 여전히 인류학적이고 공리주의적인 이해에 국한되어 있다. 하이데거에게 성배는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하이데거는 technē가 존재의 탈은폐(Unverborgenheit)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한다.
하이데거는 기술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 기재된(furnished) 사물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탈은폐에 관심을 두는 또 다른 텔로스를 제안한다. 이제 테크놀로지는 성배처럼 명확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존재의 탈은폐라는 또 다른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칸트의 자연적 목적처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존재는 실체, 사물, 공리로 환원될텐데, 탈은폐된 것은 식물이나 물 한 잔처럼 객관적인 존재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인들은 탈은폐를 알레테이아(aletheia), 즉 ‘진리’라고 불렀다. 그리스인에게 테크네는 ‘기술’과 ‘예술’을 모두 의미하는데, 둘 다 존재(Being)의 탈은폐에 속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렵지만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즉 존재란 무엇인가? 앞서 언급했듯이, 존재(Sein)는 속성을 지닌 존재, 입자의 화합물, 알고리즘 등 <81>객체(Gegenstand)로 포착될 수 있는 존재자(Seiendes)와 다르다. 그러나 존재는 수학적 증명이나 기하학적 증명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은 더 많은 해석을 요구한다. 하이데거는 존재의 문제를 명료화하고 이해하기 위해 평생을 고군분투했지만, 존재의 비객관적 현존은 파악불가능한 개방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존재에 대한 이 그리스적 질문을 열어둘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질문을 열어두는 것이 신화를 만들자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 안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우리는 하이데거의 담론이 정확히 비-합리적인 것(Nicht-Rationale)의 합리화를 포함한다는 다소 대담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27] 이는 첫째, 존재는 이성적(rational)이지도 비이성적(irrational)이지도 않은 비-합리적(non-rational)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둘째, 합리화란 논리적으로 연역하거나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관된 사고의 평면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일부 저자는 비-합리적 능력에 감정(스피노자), 의지(쇼펜하우어), 무의식(프로이트) 등이 포함된다고 제안할 것이다.[28]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로고스나 ‘도’(dao, 道) 등 이러한 범주에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용어도 포함할 수 있다.[29]
그러나 하이데거에게 비-합리적인 것은 존재와 시간에서 분석의 중심이 되는 기분(Stimmung)이긴 하지만 감정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합리적인 것은 신이 아니다. 그것은 외계의(extraterrestrial) 지성이 아니라 세계 자체 안에서 발견되는 신(ein Gott) 또는 횔덜린의 영감을 받은 최후의 신(letztes Gott)이다. 그것은 세상에 있지만 “인간과 시간을 넘어 6천 피트 너머”에 있다. 최후의 신은 계산 너머에 있으며, <82>인간의 본질에 따라 개념화된 목적론 너머에 있는 신이다. “장미는 ‘왜’(why) 없이 존재한다”처럼 그것은 과학적 인과관계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태도는 근본적으로 합리성의 총체성에 저항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반인간주의적이다. 최후의 신에 대한 이러한 성찰은 하이데거에게 있어 플라톤 이후 인본주의에 해당하는 유럽 철학 이후의 다른 시작을 조건짓는 것이기도 하다.[30] 최후의 신을 합리화한다는 것은 그러한 신을 계산 가능하게 만들거나 그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도약할 수 있는 벼랑으로서 존재의 진리를 재조명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도약은 사고가 스스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단순한 태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화하고 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요구한다.
하이데거의 technē 담론에서 기술 및 예술적 과정은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화하는 한 형태이며, 이는 사고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합리화란 비이성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을 구분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여 일관성의 평면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이데거는 이를 존재의 보존 또는 진리의 재접근이라고 부른다. 「기술에 관한 물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본질’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fortgewähren, währen, gewähren(일반적으로 ‘지속하다’라는 뜻)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존재의 보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언가를 보존한다는 것은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존은 또한 그것을 단순히 소비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등 제한하는 대신 촉진하고 보살피는 형태이기도 하다. 이러한 합리화 과정은 기술의 본질적인 임무가 비-이성적인 것을 새기는 것, 더 구체적으로는 우주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코스모테크닉스 사고의 핵심이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그리스인들이 dikē라고 부르는 단어는 영어로 정의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공동/접점’(Fug)을 의미한다. 이 접합점은 자연과 인간, 압도적인 존재(Being)와 폭력적인 기술 사이의 대립에서 드러난다. 비단 그리스인의 사고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국인, 인도인, 그리고 <83>다른 많은 문화권에서도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서로 다른 논리, 인식론, 에피스테메(감성, sensibilities)를 내포하고 있다.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이 더 이상 그것의 본질을 앞에-내세움(bringing-forth) 또는 포이에시스(poeisis)로서 그리스적인 테크네와 공유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 드러냄의 방식은 앞에-내세움이 아니라 도발(Herausforderung)이다. 일반적으로 기술 활동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술에서 탈은폐 기능이 박탈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이제 그 드러내는 방식은 도발적이다. 이 차이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현대 기술은 현대 과학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인식론에 의존하고, 현대 과학은 실험과 연구의 도구로서 현대 기술에 의존한다. 이러한 상호 정보 공유는 하이데거가 방법의 승리(Sieg der Methode)라고 부르는 공통점을 공유한다.[31] 나는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근대성을 특징짓는 것은 어떤 완성된 세계상(Weltbild)으로 이어지는 인식론적, 방법론적 격절이라고 제안한다.[32]
르네상스 이후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간 과학은 케플러, 갈릴레오, 뉴턴, 그리고 데카르트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기하학의 필증성(apodicticity)에 다시금 기반을 두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기하학적 접근 방식 외에도 과학은 오늘날 실험 과학으로 알려진 프란시스 베이컨, 로버트 보일(Robert Boyle) 등이 주창한 과학을 통해 발전했다.[33] 중요한 것은 기하학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과학적 방법의 재발견이다. 근대에 자연과학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그 방법의 승리로 인해 모든 <84>존재를 일반화된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 즉 지구상의 존재를 분해하고 분석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 보편 수학(mathesis universalis)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17세기 과학 혁명 이후 진화한 이 방법은 다양한 변형을 거쳐 사이버네틱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사이버네틱스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정보의 측정에 따라 작동하는 피드백 루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을 잡는 동작에는 근육과 신경계의 여러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피드백 루프가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유기체는 신체의 다른 부분 간 또는 유기체와 환경 간의 피드백 루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사이버네틱스는 더 이상 고대의 질료형상론과 이원론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 즉 전체로서의 존재를 파악하는 통일된 논리를 구성한다. 이는 ‘유기체적’(organismic)으로 보일지언정, 근본적으로는 자연에 대한 과학적 방법의 승리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이데거가 현대 기술의 드러남의 방식이 더 이상 앞에-내세움[생산]이 아니라 도발(challenging)이라고 말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기술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드러남은 poiēsis의 의미에서 앞에-내세움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현대 기술에서 지배적인 것은 자연에게 추출하고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라는 무리한 요구[Ansinnen]를 제기하는 도발[Herausfordern]이다.[34]
현대 기술 활동의 무리한 요구는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도발이자 폭력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하이데거가 1935년 『형이상학 입문』에서, 그리고 1942년 횔덜린이 그의 찬가 「이스터」(The Ister)에서 선언한 것처럼 그리스어 technē 자체가 폭력적인 행위가 아닌가? 하이데거는 그가 자세히 분석한 유일한 비극인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의 한 구절을 해석함으로써 존재의 압도적인 힘에 맞서는 technē의 폭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이 <85>두 가지 폭력적 형태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현대 기술도 비록 수행 방식은 다르다고 해도, 어떤 것을 탈은폐하는 한에서 그리스의 technē와 같은 유형의 폭력을 공유한다고 말해야 하는가? 그리고 현대 기술에서 폭력이 수행되는 방식이 무리한 것인가? 무리한 요구는 상대방의 의지와 수용을 넘어서는 것으로, 요구가 아니라 학대가 된다.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의 본질을 ‘틀 짓기’(닦달, Gestell)라고 부른다. Gestell은, bestellen, nachstellen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문하다’, ‘놓다’, ‘설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stellen에서 유래한다. Gestell은 모든 존재를 수집하고 배치된 비축물(Bestand)에 주문할 수 있다는 의미, 즉 착취할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리스 신전의 돌을 주문하는 것과 수력발전소의 물을 주문하는 것의 차이점은 정확히 무엇인가?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력 발전소는 라인강의 흐름에 맞춰 세워진다. 그것은 라인강이 수압을 공급하도록 설정하고, 터빈이 회전하게 한다. 이 회전은 장거리 발전소와 그 케이블 네트워크가 전기를 보내기 위해 설정된 전류를 보내는 추력을 가진 기계들을 움직이게 한다. 전기 에너지의 질서 있는 배치와 관련된 연동 프로세스의 맥락에서 보면 라인강 자체도 우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수력발전소는 수백 년 동안 강둑과 강둑을 이어주던 오래된 목조 다리처럼 라인강에 건설된 것이 아니다. 그와 달리 강이 발전소 안으로 들어가 댐이 된다.[35]
파에스툼(Paestum)의 그리스 신전이나 라인강의 목조 다리 건설은 지구를 부존자원으로 투영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장인의 기술적 활동으로서 그 결과물을 생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력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는 자원을 착취 가능하고 이윤획득이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기술적 장치이다.[35] <86>이는 인간과 비인간적 존재, 인간과 대지 사이의 관계에서 현대 기술의 작동으로 인한 관계의 어떤 격절에 의해 규정된다. 삶의 한 형태로 표현되는 이 격절은 현대 과학이 부과한 인식론적, 방법론적 파열과 일치한다.
하이데거의 기술 개념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분석에 동의한다면, 현대 기술에서도 탈은폐는 여전히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체르노빌, 후쿠시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등과 같은 재앙의 형태로 나타나 진보주의적 낙관주의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종말론적 계시에만 호소하지 않으려면 기술의 이해, 사용, 발명과 함께 기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 탐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즉 존재-물음이 어떻게 기술에 통합될 수 있는가?
기술이 존재를 통합할 수 있다면 기술은 이미 서구 문화에서 자신의 운명을 초월했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은 하이데거 자신의 생각과 즉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며, 더 이상 존재의 망각과 동일하지 않다. 또는 기술은 하이데거가 말한 현대 기술이 아니라 그리스어 technē도 더 이상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이데거에 대한 다른 주석가들이 하이데거에게 있어 탈출구는 Gelassenheit(흔히 ‘초연한 내맡김’으로 번역됨)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나는 하이데거의 후기 저작에서 내가 코스모테크닉스적 사유라고 부르는 것에 반향하는 기술을 다시 상상하자는 제안을 발견했다. 내가 보기에 Gelassenheit는 기술적 현실을 넘어 더 넓은 또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말대로) ‘더 고차적 현실’[36]로 향하는 첫 단계에 불과하며 이 높은 현실에서 기술적 활동이 재정위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론/실천 또는 주체/객체 이원론에 계속 의존함으로써 사유 자체를 취약하게 만드는 기술에 대한 관념론적 비판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 대신에, 기술과 더 넓은 실재 사이의 일관된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즉 비-합리적인 것 - 예컨대 존재 - 을 합리화하기 위해 현대 기술을 적정화하고 변형함으로써 비-합리적인 것의 합리화를 Gelassenheit를 넘어서는 단계로 설정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더 넓은 실재’란 기술의 근거가 되거나 기술을 인류학적, 공리주의적 의미를 넘어서는 위치에 놓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존재론적 차이의 극복이라고 부를 수 있다. 나는 이에 대해 이 장의 뒷부분에서 상술할 것이다.
§9 인공적인 것 안의 진리
하이데거는 「기술에 관한 질문」이 나오기 약 15년 전에도 「예술 작품의 근원」에서 그리스어인 technē 개념을 기술이라기 보다는 예술이라는 의미로 직설적으로 언급했다. 나는 하이데거의 초기 논문인 「예술 작품의 근원」이 이미 현대 기술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되었다고 확신한다. 그렇다면 기술의 역사는 예술의 역사와 어떻게 다른가? 나아가 예술 작품의 근원에 대한 재구성이 현대 기술 시대에 어떻게 비판적 성찰을 제공할 수 있는가?
우선 하이데거의 논문의 제목인 예술 작품의 근원(Der Ursprung des Kunstwerks)을 살펴보자. 여기서 Ur-sprung, 즉 근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이데거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예술 작품의 경험, 즉 <88>그들의 지역성(Ortschaft)을 정의하는 그리스인들의 내면적인 영적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37] 예술 작품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는 데 왜 이것이 중요한 질문인가? 다시 말해, 우리는 이 근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역사는 우리가 그것의 근원[기원]이라고 부르는 특정 지점으로부터 연대기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근원[기원]을 호출하는 것은 역사를 구성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도약, 즉 Ur-sprung이 시작된다. 그러나 기원에 대한 모든 탐구에는 항상 그 이전에 다른 기원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출발점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 이 역설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에서 분할할 수 없는 것이든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에서 원동자(prime mover)든 절대적인 지점을 설정하여 질문의 선형성을 깨뜨리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선형적 인과성, 즉 원동자는 사실 어떤 결함 있는 기원을 의미하는데, 그 절대성에 대한 증명이 없는 기원은 순전히 허구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의심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형적 연대를 사용하여 기원에 대한 질문에 답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술 작품의 근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역사가 기원을 의미한다고 말했지만, 기원은 또한 역사를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서 기원과의 관계는 ‘회상’ 또는 ‘기억’을 의미하는 anamnesis의 과정이며,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망각이 anamnesis보다 앞선다. 따라서 「예술 작품의 근원」은 고대 그리스에서의 예술 작품에 관한 경험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논문인 것이다.
이 경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잊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억’은 잊어버린 것을 되찾는 새로운 형태의 사고를 여는 것, 즉 망각은 곧 무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식을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의 기원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미술 전시회가 도처에 있고 현대 기술이 예술 창작의 주요 매체가 된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예술 작품의 근원에 대한 질문은 1930년대의 하이데거와 2020년대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실제 상황에 대한 응답이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예술 작품의 근원에 관한 질문에 완전히 답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게 될 이유 때문에 왜 이 질문을 제기해야 하는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두 가지 질문을 더 제기할 수 있다. 예술 작품의 근원적 경험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89> 그러한 경험은 하이데거를 따라 우리가 닦달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실제적 상황에 대한 가능한 반응으로 이해 될 수 있는가?
예술 작품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다소 어려운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하이데거는 예술의 세 가지 실체, 즉 사물(Ding), 도구(Zeug), 작품(Werk)을 숙고할 것을 제안한다. 이 세 가지 개별 실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도구는 예술 작품과 마찬가지로 사물이다.
작품은 루르강에서 나오는 석탄이나 검은 숲(Black Forest)에서 나오는 통나무처럼 운송된다. 전쟁 기간 동안 횔덜린의 송가는 청소 장비와 함께 군인의 배낭에 싸여졌다. 베토벤의 사중주곡은 지하실의 감자처럼 출판사의 창고에 놓여 있다.[38]
문화 산업에서는 모든 예술 작품을 시장의 수요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상품으로 취급한다. 이런 의미에서 예술 작품은 한 조각의 석탄이나 감자와 같은 ‘단순 사물’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예술품은 어떤 것인가? 도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조각 작업이 의자 만들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예술 작품에는 무엇이 작용하는가?
그리스인들이 energeia라고 부르는 것은 흔히 ‘현실성’(actuality)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어떤 것의 잠재성(potentiality, dunamis)을 닫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에-내세움을 의미한다. 예술 작품은 진실을 드러내는 aletheia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예술은 우리가 의자를 만들거나 책상을 수리하는 것처럼 일상 생활에서 그 기능이 완전히 잊혀지지 않는 장인 정신이라고 일컫는 technē이다. 하이데거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예컨대 praxis와 poiesis 구분)에 반기를 들며 테크네로서 예술은 반드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앎의 방식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전 문헌학에 따르면, poiesis는 영혼의 외화(externalization)를 요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ergon과 같은 결과물에서 기본적으로 마무리 된다. 반면에 praxis는 영혼의 내면성으로 돌아가는 내화를 더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 praxis의 가장 높은 형태는 실용적인 지혜 또는 신중함, 즉 phronesis이다. 그러나 하이데거에게 <90>technē는 반드시 ergon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앎의 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 경우 technē는 완전히 poiesis라고 할 수 있는가?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도구의 일상적 사용과 역사의 ‘이미 거기’(schon da)에 대한 관심 또는 배려(Besorgen)을 분석했지만, technē와 존재 사이의 관계에서 접근하지는 않았다. 하이데거의 사유에서 기술의 역사를 존재 망각의 역사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전회(Kehre) 이후이다. 따라서 자크 타미니오(Jacques Taminiaux)가 technē의 해석이 1930년 하이데거의 전환기의 한 가지 특징이라고 주장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미묘한 지점을 상기하고자 한다. 하이데거는 『형이상학 입문』에서 technē를 앎의 방식과 연관시켰고, 『예술 작품의 근원』에서는 technē를 - 앎일 뿐만 아니라 행위인 - 예술과 연관시켰다. 예술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최종 생산물만이 아니라 작품 안에서의 작동과정이기도 하다. 여기서 작동하는 것은 ergon이 아니라 energeia이다. 작동하는 것은 세계와 대지 사이의 투쟁(Streit)으로 드러나는 바, 어떤 사건의 시작이다.
그런데 왜 하늘과 대지가 아니라 세계와 대지 사이인가? 아니면 중국 사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것은 하늘과 대지와 인간 사이인가? 이 ‘세계와 대지’의 관계는 특별히 그리스적인 것인가, 아니면 서구적인 것인가? 일반적으로 인간이 세상을 열었다는 의미에서 세계는 anthropos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자체가 없이 그리스인의 현존재든 또는 다른 누구든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anthropos는 또한 세계에 속한다. 세계는 대지로부터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라 대지와의 오랜 투쟁이나 대립을 통해 생겨난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적인 비극적 사고의 조건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갈등, 적대감을 포함하고, 거기에는 그 어떤 진행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소포클레스의 가장 위대한 희곡 중 하나인 『안티고네』뿐만 아니라 이 희곡에 대한 하이데거 자신의 해석에서도 자명하다. 대지는 스스로 닫히는 것이고, 세계는 대지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들은 두 가지 힘뿐만 아니라, 두 가지 실재도 드러내는데, 하나는 그리스인들이 phusis라고 부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technē라고 부르는 것이다. 세계는 그것을 구성하고, 잉태하고, 대대로 전달할 수 있는 앎의 방식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91>“세계는 세계가 된다”(Welt weltet). 그러나 그러한 세계되기(worlding, Verweltlichung)가 가능한 것은 technē를 통해서이다. 세계는 그것이 지구와의 관계 역사적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이며, 둘 사이의 역학 관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의미에서 역사적이다. 오늘날 우리가 물려받은 세계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경험한 세계와 같지 않으며, 우리 조상들이 경험한 세계와도 다르다. 지구는 세계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땅이다. 그러나 Phusis는 헤라클레이토스가 “자연은 숨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한 것처럼 스스로를 닫고 현존재로부터 돌아서는 경향이 있다.
대지의 외면은 존재의 은폐이기도 하다. 은폐된 것은 탈은폐된 채로 남아 있다. 세계는 대지의 탈은폐가 아니라 오히려 대지와 세계 사이의 투쟁이 탈은폐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대립은 『형이상학 입문』에서도 존재의 압도적인 힘과 기술적 존재인 인간의 폭력성 사이의 충돌로 표현된다.
세상에 기괴한 것이 많다 하여도
사람보다 더 기괴한 것은 없다네.
사람은 사나운 겨울 남풍 속에서도
쟂빛 바다를 건너며 내리 덮치는
파도 아래로 길을 연다네.
그리고 신들 가운데 가장 신성하고
무진장하며 지칠줄 모르는 대지를
사람은 말[馬]의 후손으로 갈아 엎으며
해마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돌아서는 쟁기로 못살게 군다네.[39]
하이데거가 인용한 『안티고네』의 이 구절에 따르면 인간은 ‘가장 기괴한 것’으로 번역되는 deinotaton에 해당한다. 하이데거의 용법에서 unheimlich는 때때로 ‘집에-있지-않음’(unheimisch), ‘기괴한’(monstrous) 또는 ‘이상한’(extraordinary, <92>Ungeheure과 혼동되기도 한다. 이 세 단어는 모두 인류(anthropos)의 기술적 존재가 낯설다는 것을 가리킨다. 대지(earth)와 세계(world)의 대립은 기술적 도구의 발명과 사용으로 매개된다. 즉, dikē가 나타나고 aletheia가 일어나는 것은 기술적 활동을 통해서이다. 하이데거가 『예술 작품의 근원』에서 사건의 시작이라고 언급한 반 고흐의 농민 신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술 작품은 대지와 세계 사이의 투쟁이 연출되는 장면을 설정한다.
장비의 장비성(equipmentality)은 실제로 그 유용성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자체가 장비의 본질적인 존재의 충만함에 달려 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성[Verlässlichkeit]이라고 부른다. 이 신뢰성 덕분에 농부 여인은 대지의 조용한 부름에 응하고, 장비의 신뢰성 덕분에 자신의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세계와 대지는 그녀와 오직 여기, 즉 장비 안에서의 존재양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40]
존재의 탈은폐는 지구와 세계 사이의 이러한 투쟁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이 투쟁은 예술 작품에 보존되어 있으며, 더 정확하게는 이 투쟁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예술 작품은 농부의 신발을 매개로 대지와 세계 사이의 우발적 만남을 필연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러한 탈은폐의 가능성, 즉 진실, aletheia를 담고 있다. 예술가는 자신의 윤곽형성(outlining, Aus-riss)에서 균열(Riss)을 포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역사학자 메이어 샤피로(Meyer Schapiro)가 반 고흐의 실제 신발이라고 밝힌 농부의 신발 그림과 같은 예술 작품은 정적이지만 투쟁과 균열의 역동성을 간직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한계이기도 한 Umriss를 준다. 여기서 제한은 한계, peras이다. 무한한 세계와 대지 사이의 투쟁, 즉 아페이론(apeiron)을 포착하는 것은 그림의 유한성, 즉 페라스(peras)이다. 예술 작품은 이 투쟁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보존(bewähren)하며, 여기에 아름다움(Schönheit)이 있다.
하이데거는 비극적 숭고의 형태, 즉 유한과 무한, 세계와 대지 사이의 필연적 모순을 <93>해결 불가능한 갈등 속에 있는 진리의 조건으로 일반화한다. 진리는 화해할 수 없어 보이는 갈등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드러날 수 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비진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갈등이 해결될 수 없으므로 어떤 결론도 진리 또는 비진리를 나타낼 수 없다. 진리는 작품이 작동 중인 존재 속에서 드러날 가능성은 있지만 수학적 증명의 방식으로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이데거는 투쟁의 보존을 통해 존재의 탈은폐 가능성을 예술 작품의 근원으로 간주한다. 『철학에의 기여』에서 「현존재와 마지막 신의 미래 존재자」라는 제목의 252절에서 하이데거는 다시 세계와 대지라는 주제를 다룬다.
세계와 대지는 그것들의 투쟁에서 사랑과 죽음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이며, 존재자에 관한 진리의 다양한 지배 안에서 신에 대한 충실함과 혼란을 견딜 수있는 능력으로 그들을 통합할 것이다 [...] 이 투쟁의 놀이에서 마지막 신의 미래 존재자들은 투쟁을 통해 사건에 도달하고 가장 넓은 회고 안에서 가장 위대한 창조물을 성취된 반복 불가능성과 존재의 독특성으로 회상할 것이다.[41]
투쟁은 철학의 종말 이후 다른 시작에서 출발할 ‘미래 존재자들’[Zukünftigen]이 그 사건을 기대하고 도달하기 위한 준비이자 매개체이기도 하다. 그리고 예술의 한 가능성인 이 길은 회화가 외부 현실의 재현으로 환원될 때 막혀버릴 것이다. 하이데거는 technē를 시와 연관시킴으로써 poiesis의 감각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는 낭만주의자들이나 헤겔처럼 예술의 결정적인 힘은 시적인 것이라고 말할 때 분명해진다.[42] technē와 예술의 연관성은 하이데거에게 더 이상 기술[일반]이 아니라 Gestell로서의 현대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94>하이데거는 『예술작품의 근원』의 발문에서 Gestalt(‘형태적인 것’the figural이라고 부를 수 있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Gestell이라는 용어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제시한다.[43] Gestalt는 또한 형태가 불활성 물질에 동일성 또는 본질(ousia)을 부여하는 고전적 질료형상론을 통해 물질보다 형태를 우선시하는 Gestalt와 밀접하게 관련된다.[44] Gestalt와 Gestell 모두 ‘닦달’(framing)의 의미를 내포한다. 서양 철학이 현대 기술과 함께 종언을 고했다면, 그것은 질료형상론적 의미에서든, 알고리즘 재귀로서의 사이버네틱스적 의미에서든 궁극적인 형이상학적 실체로서의 형태[형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종말은 또 다른 시작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존재 물음을 다시 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서구 존재론의 파괴를 요구할 것이다. 여기서 Gestell을 세계의 Gestaltung[형성]과 관련하여 이해한다면, 현대 기술은 땅 없이도 자급자족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지로부터 세계를 소멸시키는 폭력적인 힘으로 간주 할 수 있다. 대지는 단지 착취를 위한 자원으로만 간주되고 표현되며, 하이데거는 이를 ‘비축품’(Bestand)이라고 부른다. 세계가 대지로부터 분리(도전challenging)되는 것(물러남withdrawing)은 대지를 스스로 은폐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며, 이러한 존재의 은폐는 끝없는 겨울로 이어진다. 하이데거는 릴케의 죽음을 추모하는 「왜 시인인가?」(1946)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술의 본질은 서서히 빛을 발한다. 이 날은 세계의 밤을 단지 기술적인 낮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날은 가장 짧은 날이다. 그것은 어떤 유일한 겨울을 위협적으로 고지한다.”[45] 이러한 전경(figure)은 그 자신의 근거(ground[배경])가 된다.
이 은유를 게슈탈트 심리학의 전경-배경 관계를 고려하여 해석할 수 있다. 전경은 배경의 전경이고 배경은 전경의 배경이지만, 전경이 배경을 점령하면, 전경은 배경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호성 안에서 불균형이 생기고 방향감각이 상실된다. 현대 <95>기술, 즉 닦달은 배경 없는 전경이다. 그것은 문명을 확실한 종말, 즉 계시 없는 종말로 밀어붙이는 거대한 힘을 구성한다. 릴케가 두이노의 비가 ‘여덟 번째 비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현대인은 더 이상 동물처럼 개방성(Offene)을 이해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다른 동물들은 온 눈으로 열린 곳을 바라본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안쪽으로 향하여 올무처럼 사방을 둘러싸고 자유로 나가는 길을 가두고 있다.”[46]
존재 망각으로 이어지는 전경과 배경의 반전은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 현대 기술로 실현된 형이상학의 역사와 함께 간다. ‘여덟 번째 비가’의 끝에서 우리는 인류 문명의 종말론적 붕괴를 보게 된다. “그리고 우리, 다시 말해 관중,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중! 그것은 우리를 덮친다. 우리가 그것을 정돈하면 그것은 파괴된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정돈하고 다시 파괴된다.”[47] 하이데거는 존재의 탈은폐를 릴케가 ‘열린 것’이라고 부르는 것과 일치시킨다. 인간 현존재가 대상을 면밀히 관찰하는 주체처럼 좁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볼 때, 대지는 스스로 물러난다. 열린 것은 과학적 대상이 아니라 존재의 다른 이름이다. 개방성(the Open)과 함께 사유한다는 것은 폐쇄와 객관화에 저항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진리, 존재의 진리를 재-근거화(re-grounding)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재-근거화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을 계산불가능한 최후의 신으로 합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사유하기와 그리기
우리는 예술 작품의 근원에 대한 탐구가 또 다른 시작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러한 시작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기술 장치의 크기보다는 형이상학적 힘의 측면에서 현대 기술의 거대함(das Riesenhafte)이 대지를 단순히 제어 가능한 사이버네틱 시스템으로 환원하는 과정에 있다면, 우리는 철학이 끝난 후의 사고의 과제가 <96>형이상학을 극복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게다가 형이상학을 극복하는 것은 철학만의 일이 될 수 없는데, 현대 기술이 그 닦달(enframing)의 논리를 넘어서 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 황량한 시대에 철학은 다른 무언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의 형이상학 극복 프로젝트는 근대성 극복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술을 통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술은 이미 헤겔이 말한 대로 완결되었다. 그러나 이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시각적이고 표상적인 것보다 이념에 더 가까운 개념예술을 헤겔 이후의 예술이라고 주장해야 하는가? 개념 예술과 헤겔의 이념[관념](이는 3장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사이의 친밀성을 확립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철학의 곤경과 예술과 현대 기술의 관계를 다루지 못하는 동시에 예술을 관광 상품과 예술 시장으로 비난하는 것이므로 불충분해 보인다.
비범함[Un-geheure]에 대한 열망이 친숙함과 감상에 사로잡히자마자, 예술 사업은 이미 작품을 탈취하기 시작한다. 후손에게 조심스럽게 작품을 전승하고 과학적으로 복원하려는 시도조차도 더 이상 작품 자체에 도달하지 못하고 단지 기억에 그칠 뿐이다.[48]
오늘날 우리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바흐와 베토벤의 음악을 듣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위대한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기계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에서 지지한 예술의 급진적 민주화, 즉 디지털 재현성 덕분에 우리는 위대한 예술가들의 작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관객과 예술 작품의 만남에 속하는 비범함은 친숙함으로 축소된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관광객이 《모나리자》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3초도 채 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그림은 흥미를 끌기 위한 산만함일 뿐이다. 하이데거의 『철학에의 기여』에서 우리는 존재의 떠남(the abandonment by Being)의 이유에 관한 목록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는다. “예술은 문화적 유용성의 지배를 받으며, <97>그 본질은 오해되며, 그것의 본질적 핵심, 진리를 근거짓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맹목적이 된다.”[49]
하이데거의 제자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미술사학자 하인리히 비간드 페체트(Heinrich Wiegand Petzet)는 텔레비전에서 파울 클레의 작품에 대한 강연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우연히 친구의 집에서 이 작품을 시청한 하이데거는 “클레 같은 예술가에게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는 그의 작품에 있어 죽음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페체트는 “나는 이 문제를 마음에 새겼고, 어쨌든 복제에 의해 위협받는 예술과 그 언어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더 이상 예술에 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다.”[50] (하이데거의 말을 따르자면) 문화 산업이 초래한(veranlassen) 예술의 종말에서, 그러한 작품의 목적인은 소비주의의 대상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예술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사유와 정치 경제를 모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 매우 제한적인 작업으로 남아 있게 된다.
하이데거는 맑스의 철학과는 달리 사유 자체에서 가능성을 찾고자 했기 때문에 정치 경제학에 관여하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철학자들의 일로서 사유는 이미 맑스가 유명한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에서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이데거는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사유를 전제로 하며, 사유 없이는 어떤 변화도 맹목적일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맑스에 대응했다. 이론과 실천의 분리는 그 자체로 현대 사상에 대한 애착을 유지하면서도 거부해야 하는 일종의 이원론이기 때문에 하이데거가 옳지만 맑스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철학자가 자신의 이론을 실천한다는 것은 화가가 예술적 실천 속에서 살아가듯이 자신의 이론을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철학자에게는 이론과 실천 사이에 대립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철학의 종말 이후에 사유의 가능성은 있는가? 일찍이 우리는 「철학의 종말과 사유의 임무」에서 하이데거가 다음과 같이 주장한 것을 알고 있다. “철학의 종말은 과학-기술 세계와 이 세계에 적합한 사회 질서의 조작 가능한 배치의 <98>승리를 입증한다. 철학의 종말은 서유럽 사상에 기반한 세계 문명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 종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다. 한 가지 길은 하이데거가 선불교와 도교에 계속 관심을 가졌지만 그 해결책으로는 거부한 비유럽적 사유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때 철학의 종말이란 필연적으로 거부된다. 왜냐하면 하이데거에게 비유럽적 사유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가 방향 감각 상실(Entwurzelung)이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비유럽 문화는 이미 유럽의 근대성을 따라잡기 위해 이러한 탈중심화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종말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길은 그 기원에 대한 기억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이데거가 1967년 연설인 「예술 작품의 근원」과 「예술의 기원과 사유의 결정」(Die Herkunft der Kunst und die Bestimmung des Denkens)을 통해 “사이버네틱스 시대에 예술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사이버네틱스가 방법의 새로운 승리(Sieg der Methode)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인식론으로서 사이버네틱스의 유기체적 본성(피드백과 정보에 기반한 자동 조절이라는 의미에서)은 초기 근대의 기계적 패러다임과 구별되며 뉴턴의 고전 역학 및 고대 질료형상론(hylomorphism)을 뛰어넘는다. 논리로서 사이버네틱스는 더 이상 주체/객체와 같은 이원론적 논리가 아니라 재귀성이라는 통합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이데거에게 사이버네틱 방법론의 승리는 기술 세계의 자기 폐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 미래학(futurology)이 어떤 명확한 피드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기원으로,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갈 것을 제안함으로써 이에 대응한다.
필요한 것은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다. 어디로? 아테나 여신을 가리키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난다고 해서 고대 그리스 세계가 어떻게든 새로워져야 하고,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 사이에서 사상이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세계 <99>문명 앞에서, 그것과 거리를 두는 것이지 결코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서구 사상의 시작에서 여전히 생각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명명되어 우리의 사유를 선형성한(prefigured) 것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52].
이 한 걸음 물러남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서구적 사유에서 이미 발음되었지만 아직 생각하지 못한 것을 보기 위해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노력이다. 생각하지 못했지만 선언되었고, 아직 들리지는 않는다. 아직 생각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정확히 기억(anamnesis)을 의미한다. 하이데거의 주요 원천이었던 헤라클레이토스, 파르메니데스, 아낙시만드로스의 단편과 같은 흔적은 이미 선언된 것이다. 사유되지 않은 것은 해석해야 할 것으로 남아 있는 것, 궁극적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의미를 말한다. 그것은 해석학적이므로 재귀적이다. 또 다른 루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긴 우회로를 거쳐 다시 자신에게 돌아와야 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하이데거의 문화적, 철학적 프로젝트 이후 유럽과 그 미래를 재편하기 위한 또 다른 시작을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하이데거는 유럽의 사상가이자 본질의 사상가이기 때문에 그의 사유는 역사적 유럽의 현존재가 속한 장소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성(Erörterung)은 역사적 현존재와 그 장소성(Ortschaft)을 식별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이다. 그리고 하이데거의 사유에 시간에서 공간으로의 이동이 있다면 (피터 슬로터다크Peter Sloterdijk의 주장처럼) 그것은 하이데거가 공간을 재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이데거가 다른 사상을 빌리지 않고 근대성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 즉 그에게 있어서는 정확히 탈근대를 의미하는 유럽, 영적(Geistlich) 땅인 Abendland로 돌아가는 것만이 근대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53]
<100>하이데거가 예술의 문제, 존재의 지역성(locality of Being)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예술에 비범한(extraordinary) 어떤 것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비범한 것에 대한 사유를 우리가 코스모테크닉스적 사유라고 부르는 것과 연관시킬 수 있는데, 이는 그가 소크라테스 이전의 사상가들로 돌아가 로고스의 신비에 숨겨진 다른 시작을 탐구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토 푀겔러(Otto Pöggeler)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예술 작품의 근원」 속편을 쓰고 싶었고, 그 결정적인 계기는 세잔, 더 나아가 클레와의 만남이었다. 이 만남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하이데거의 후기 예술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술을 통한 이러한 사유의 전환이 우리가 ‘틀짓기[닦달]의 재구성’(reframing of the enframing)이라고 부르는 것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하이데거는 1950년대 후반, 바젤에서 미술상이었던 친구 에른스트 바이얼러(Ernst Beyeler)가 주최한 클레의 작품 전시회를 방문했다고 한다. 하이데거는 클레의 그림 중 두 점인 《영웅적 장미》(Heroische Rosen, 1938)와 《다이나모 방사상의 초문화》(Überkultur von Dynamoradiolaren, 1926)에 매료되었다. 그는 “가을 서리 속에서 빛을 잃은 영웅적 장미의 거의 고통스러운 파토스”와 “클레가 그림에서 기분[Stimmungen]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54] 하이데거는 세잔과 클레의 작품에서 기술과의 대립과 그 본질에 대응하려는 시도를 보았다.[55] 귄터 슈볼트(Günter Seubold)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이데거는] 「예술 작품의 근원」이 “역사적으로 사유”하며 “과거에 있었던 작품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미래의 예술은 “더 이상” 「예술 작품의 근원」에서 주제화했던 것처럼 세계를 설정하고 대지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접합의 사건(the event of the juncture)에서 관계를 이끌어내는 것”을 그 과제로 삼는다.[56]
<101>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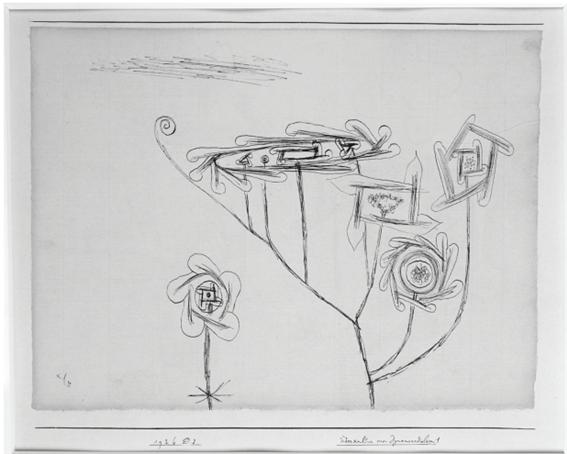
<103>이러한 진술은 1936년 「예술작품의 근원」과 하이데거가 아예 발표하지 않은 속편 사이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 같다. 아마도 그의 후기 예술 사상은 더 이상 세계와 대지 사이의 투쟁을 다루지 않고, 오히려 ‘접합의 사건’, 즉 Erbringen des ver-Hältnisses aus Ereignis der Fuge에서 비롯된 관계성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을 것이다. 하지만 슈볼트의 표현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예술에 대한 하이데거의 생각에 정말로 중대한 변화가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단지 말이 바뀐 것일까? Fug는, 흔히 ‘정의’로 번역되지만 하이데거가 ‘접합’ 또는 ‘연결’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 그리스어 dikē를 하이데거가 번역한 단어이다. Fuge는 음악적 의미에서 Fug의 복수형이기 때문에 비독일어권에서는 모호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이데거가 『형이상학 입문』, 『아낙시만드로스의 단편들』, 『철학에의 기여』 등에서 Fug를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후 단편 에세이 「살아 있는 랭보」(Rimbaud vivant, 1972)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하이데거가 Fug에 대해 사유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이데거는 리듬이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그는 관-계(Ver-hältnis)라고 대답한다.[57] 한편, 현재 클레와 관련된 우리의 맥락에서는 클레가 음악가로서 훈련을 받았으며 클레의 작품에서 음악적 구성 또는 오히려 다성적 회화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푸가’(fugue)를 의미 할 수도 있다.[58]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염두에 두고자 할 것이다. 즉 실제로 접합/연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 사이에 있는가?
하이데거는 세잔의 ‘몽 생 빅투아르’(Mont Sainte-Victoire) 그림을 보고 화가와 형제애적 유대감을 느꼈다. 그는 엑상 프로방스(Aix-en-Provence, 하이데거가 이상하게도 제2의 고향이라고 주장했던 곳)를 방문했을 때[59] 세잔이 그린 각도에서 산을 바라보며 <104>세잔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상가로서의 내 자신의 길이 나름의 방식으로 응답(대응)하는 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60] 세잔 - 들뢰즈에 따르면 사과를 그린 화가 - 이 존재의 철학자 하이데거에게 그토록 흥미로웠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이데거는 세잔의 후기 작품 《정원사 발리에르》(Le Jardinier Vallier)를 접한 후 르네 샤르(René Char)에게 헌정하는 짧은 글 모음집에 시 한 편을 썼다. 시의 제목은 ‘세잔’이다.
사려 깊게 고요함, 긴박한 고요함,
쉐멩 데 로브(Chemin des Lauves)에서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돌보는
늙은 정원사 발리에르의 모습.
화가의 후기 작품에서
현존과 현전의 이중성은
하나가 되어 동시에 ‘실현’되고 극복되어
신비로 가득 찬 정체성으로 변모했다네.
여기에 시와 사상이 함께 속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어떤 길이 드러났는가?[61]
물론 이곳의 ‘쉐멩 데 로브’는 하이데거가 1940년대 후반에 쓴 다소 아름다운 「들길」(Der Feldweg)과 공명한다. ‘들길’은 역사를 가로질러 적절한 장소(Ort)에 도달하는 길이다. 이 길은 농부가 밭으로 들어가고 아이들이 초원 가장자리에서 첫 앵초꽃을 뽑는 어떤 물리적 실체이다. 또한 그것은 현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장소가 아닌 지구상의 한 지점으로만 간주되는 Ort로부터 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디지털 신호를 마치 신의 음성처럼 청취하는 현대인들이 듣기를 거부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62] 세잔이 그리고자 하는 깊이를 향해 뻗어나간다는 점에서 『들길』(Feldweg)과 비교할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쉐멩 데 로브》이다.
<105>

<106>

깊이는 <107>의 메시지가 관객에게 전달되는 장소이다. 하이데거의 시에서 보면, 그는 세잔의 그림에서 리듬감 있는 움직임을 발견한다. ‘현존’과 ‘현전’을 뜻하는 것은 Anwesenden과 Anwesenheit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클레를 따라갈 수 있다. Vorbildliche(모사되는 이미지)와 Urbildliche(원초적 이미지),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하이데거는 친구들 사이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유포 된 버전에서 그 시에 한 문장을 추가했는데, 이는 하이데거의 근대성 극복 프로젝트와 세잔의 그림 사이의 친밀감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세잔이 ‘현실화’(la réalisation)라고 불렀던 것은 현존[des Anwesenden]를 지우는 가운데 현전[des Anwesens]이 명확해지는 것, 즉 이 둘의 이중성[Zwiefalt]이 그의 그림의 순수한 광채의 하나됨[Einfalt]에서 극복되는 방식이다. 사유의 경우, 이것은 존재와 존재자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를 극복하는 문제이다.[63]
위에서 살펴본 현존과 현전이라는 쌍은 우선 두 가지 존재 방식을 암시하는 그 둘의 차이점을 드러낸다. 하나는 끊임없이 존재하고 다른 하나는 형태와 관련되어 있다. 세잔은 이 대립을 조화시키기 위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친다. 현존과 현전의 차이는 하이데거의 철학적 어휘, 즉 존재와 존재자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로 번역된다. 크리스마스 선물의 이 문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림은 이 존재론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유와 같은 과제를 공유한다. 세잔의 그림은 객관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것을 선물로 만들어 형태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실화를 세잔의 과제와 동일시할 수 있다면, 하이데거가 자신의 『들길』을 세잔의 《쉐멩 데 로브》와 연관시키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그것은 지적인 동시에 인격적인 것이다.
모리스 메를로-퐁티가 그의 유명한 에세이 「세잔의 죽음」에서, 세잔이 죽을 때까지 자신이 아직 자연을 묘사하는 기술을 터득하지 못했다고 여겼다면, 이 <108>의심은 형태를 완전히 초월하려는 야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상적인 것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말처럼 그림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캔버스에 투영된 진부한 표현, 전통적인 구성 규칙, 사물에 대한 순진한 이해 등 회화 이전의 것들을 제거(débarrasser)하는 어떤 파국적 사건이 필요하다. 진부함을 파괴하려는 의도는 모든 위대한 화가에게서 발견할 수 있지만, 각 화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림의 힘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다. 현대 미술의 시초로 여겨지는 마네의 작품에서는 평면성(flatness)을 향한 의도를 관찰할 수 있다. 세잔에서는 회화의 깊이를 향한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64] 이것은 기계화와 산업화에 의해 증폭되는 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명한 파괴적 합리성에 대한 대응으로서 근대 미술의 공통된 과제였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슈볼트와 페체트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하이데거는 바우하우스 유파(Bauhaus school)의 모든 작품을 감상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하이데거는 - 초현실주의이든 추상 또는 구상이든 간에 - 현대 미술은 여전히 존재의 포착을 욕망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형이상학적이라고 주장한다.[65] 바우하우스 회화는 아직 ‘존재론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형이상학적인 것이다. 그들의 산업주의를 극복하려는 시도에는 여전히 형태 자체를 넘어서는 대신 대안적 형태와 씨름한다. 회화는 여전히 사유의 기하학적 양식으로 형태 잡힌 기계이며, 따라서 형이상학을 극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의 지배력을 간접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반대로 고대 그리스의 비극적 사상가들은 아직 형태[형상]라는 최고의 원리 아래 그들의 사상을 포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비형이상학적 또는 전형이상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형이상학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소크라테스 이전의 비형이상학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형이상학 이후의 사고는 <109>다른 시작을 위치잡기 위한 영감을 제공할 뿐이므로 소크라테스 이전의 사상가들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세잔은 비형이상학적 사고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캔버스에서 비형이상학적인 것을 찾았다. 세잔은 하이데거에게 그러한 가능성의 한 시작점이다. 하이데거는 『이완』(Nachlass)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잔이 클레와 함께 시작하고 준비한 것은 앞에 내세움 [Hervorbringen]이다.”[66]
세잔은 실제로 무엇을 준비했고, 클레는 정확히 무엇을 받아들였는가? 우리는 세잔이 1870년의 《라 트랑쉐》(La Tranchée)부터 산업주의적 배경에 반대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그림에서 집과 산은 서로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아직 치유되지 않은 어떤 상처에 의해 분리되어 있지만, 화해 가능하다. 세잔은 말년에 엑상 프로방스에서 30점의 유화와 45점의 수채화 작품으로 생-빅투아르 산을 그렸는데, 이는 화가가 이 지역과 (지질학자인 앙투안 포르투네 마리옹Antoine-Fortuné Marion을 통해) 지질학에 대한 관심을 밀접하게 연결한 시도이기도 하지만 자연 속에서 살면서 그림을 통해 자연이 자신 안에서 살게 하려는 그의 야심과도 관련이 있다. 만약 이를 비형이상학적인 예술을 향한 시도로 이해한다면, 클레는 이 작업을 시작하고 지속한 것이다. 여기서 하이데거는 그리스어 technē의 개념인 poiesis 또는 Hervorbringen으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그리스어로 돌아가는 것은 하이데거 자신이 1935년에 제안한 것, 그리고 그가 피하고 싶었던 것을 대립시키는 것인가? “이를 위해 그리스 철학의 부활이 필요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 설령 그런 부흥이 가능하다고 해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67] 하이데거는 Hervorbringen로써 ‘원래의’ 그리스적 의미와는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산업화 이전, 형이상학 이전의 사고 방식이라기보다 대규모 산업화의 도래와 긴 겨울의 시작으로 재해석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는 하이데거의 글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우리가 더 탐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하이데거가 그토록 영감을 받았다고 생각한 세잔과 클레 사이의 연속성은 무엇인가? 기술과 자연 사이의 대립을 화해시키려는 시도인가? 현대에 자연이 <110>phusis이기를 멈춘다면, 이 화해는 고대 그리스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일관성의 평면(plane of consistency)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자연은 착취 가능한 자원이자 거대한 유기체로 이해된다. 자연에 특정한 유기적 구조나 기관이 주어지더라도 자연에 대한 기계적 관점을 포기한 인간은 유기체적인 방식으로 자연을 이해하고 지배하려고 한다. 1930년대에 이미 하이데거는 이른바 『검은 노트』에서 “‘유기체’(organism)와 ‘유기적인 것’(organic)이 성장의 영역인 ‘자연’에 대한 근대성의 기계론적-기술적 ‘승리’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68]라고 쓴다. 하이데거가 추구한 것은 자연과 기술을 유기적으로 조직하는 방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것이 17세기 기계론보다 덜 명확한 형태의 틀을 제시하더라도 여전히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하이데거가 여기서 추구한 것은 어떤 재-근거화(re-grounding[재-배경화]), 즉 존재의 합리화이다.
클레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고 세잔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위대한 사상가와 예술가들은 서로 다른 언어에도 불구하고 같은 질문에 관심을 가졌다. 그렇다면 하이데거가 클레에게서 발견한 존재와 동등한 것은 무엇인가? 하이데거가 클레에 대해 말한 것에 대해 페체트가 제공한 다음과 같은 실마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작품에 대한 클레 자신의 해석(‘우주적’ 등)이 실제로 이 작품에서 일어나는 일의 전부를 나타내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태시즘(Tachism) 전체는 아마도 형이상학과 도달해야 할 것 사이의 가장 위험한 접촉점 중 하나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잘못된 자기 해석의 결과 - (무의식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 - 일 수 있다.[69]
존 살리스(John Sallis)는 하이데거가 “클레의 이론적 구성이 그의 예술 작품의 독창적 성격에 부합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고 제안한다. 즉, 클레의 이론과 실제 작업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111>굴욕적인 일은 없을 것이다! 하이데거의 의심은 ‘우주적 등’과 같은 단어의 모호함을 통해 이해해야 하지만, ‘우주적’은 형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화(forming) 과정으로서의 회화에 대한 클레의 주장을 가리킨다. 이러한 ‘형태화’는 구성과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상(figure) 그 자체를 훨씬 뛰어넘는 어떤 출생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는 ‘그 자신으로부터 나옴’을 포함하기 때문이다.[70]
§11. 예술과 우주적인 것
하이데거와 클레 둘 모두에게 우주가 중요한 질문이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이데거는 클레의 예술에서 우주와 관련하여 일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을 의심한다. 그러나 어째서 그에게 일관성의 결여와 같은 것인 문제가 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하이데거로부터 내가 ‘코스모테크닉스적’ 사유라고 이름 붙인 것으로 진입하는 ‘도약’을 취해야 한다.[71]
하이데거가 앞에 내세움(Hervorbringen)으로, 즉 소크라테스 이전으로 돌아간 것은 그리스 우주론에 관한 재해석의 관점에서 보자면 기술과 예술의 문제를 이해하려는 시도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하이데거의 존재를 클레의 ‘우주적인 것’(cosmic)과 연관시키는데, 이는 단순히 존재에 대한 이해가 그리스인들이 거주하는 세계 - 코스모스, 이것은 적어도 ‘질서’와 ‘세계’라는 두 가지 사태를 의미한다 - 의존하기 때문이 아니라, 클레에게 ‘우주적인 것’이 어떤 객관적인 과학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이 그의 창조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우주적 삶은 도덕적 삶을 고지한다. 중국인과 <112>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그들의 우주적 삶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할 것이고, 그리스인들이 그랬던 것과 동일한 합리화에 도달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상이한 신화와 관습에 따라 표현된다. ‘우주’라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는다 해도, Beiträge는 마찬가지로 존재의 계산가능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어떤 시도로 읽힐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적어도 여섯 가지 이상의 운동을 전개한다. 그것은 공명(resonating[동조]), 상호작용(interplay), 도약(leap), 근거짓기(grounding), 미래의 인간, 그리고 최후의 신이다. 이러한 합리화는 존재의 거부와 존재의 떠남(abandonment by Being)에 관한 인식(또는 공명)으로 시작된다. 이 거부와 떠남은 동시에 비-객관적이고, 계산불가능한, 증명불가능한, 그리고 비-합리적인 존재에 관한 어떤 탐색이다.[72] 또한 이것은 존재에 관한 질문이 망각된 긴 역사적 과정으로서 철학의 종말 이후의 또 다른 시작을 위한 탐색이기도 하다.
난점은 우주적인 것의 해석이 현대 기술에 관한 거대 형이상학의 힘에 맞서기에 충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우주에 대한 어떤 고루한 개념으로의 회귀는 우선 현대와 전통 사이에 대립을 양산한다. 이러한 대립은 자아와 타자에 기반한 직관적인 면역(immunological) 행위 또는 선형적인 부정의 형식에서 비롯된다. 만약 다른 시작이 - 우리가 예술을 통해 사유하고자 하는 서양 형이상학의 시작과는 다른 - 단지 존재의 거부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기술에 대한 관습적이고 취약한 비판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대립은 세 번째 상, 즉 비극적 사유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시도가 생산적이 되려면, 우주나 자연이 더 이상 기술에 대한 단순한 대립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존재와 존재자를 두 개의 분리된 영역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그것은 어떤 운동을 마련하는 필연적인 대립이다. 그러므로 재발명될 필요가 있는 것은 보다 생태적이거나 효율적인 특수한 기술이 아니라 그것의 전체성과 다양성 안에서 기술을 사유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회고적으로 봤을때, <113>비록 하이데거가 지적했듯이, 클레가 가는 방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불분명하다 해도, 우리는 클레의 예술적 창조가 그와 같은 가능성으로 향하는 어떤 전망을 제공한다고 숙고할 수 있다. 그렇다면 클레 안에 세잔이 미리 마련한 시작 지점은 무엇인가? 세잔처럼 클레도 아직-가시적이지-않은 사물의 깊이를 탐색했다고 이해해야 하나? 『창조적 신조』(Creative Credo)에서 클레는 가시적인 것이란 “우주로부터 취해진 어떤 고립된 사례”일 뿐이라고 선언한다.
이전에는 예술가들이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것,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거나 보고 싶어 했던 것들을 묘사했다. 이제 가시적인 사물들의 상대성이 명확해지면서 가시적인 것은 우주에서 떼어낸 고립된 사례일 뿐이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진실이 더 많다는 믿음이 표현되었다. 사물은 확대되고 증식되어 나타나며 종종 어제의 합리적 경험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우연적인 것(the accidenta)에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다.[73]
클레 회화의 주제는 그의 주장했던 것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 우연적인 것이다. 클레는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으로 만들고자 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 클레는 보이지 않는 것을 애써 드러내는 새로운 시각적 회화 언어를 개발해야 했다. 클레의 그림을 보고 특정 대상을 식별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즉시 그의 언어를 따라가는 데 실패한다. 이 시각적 언어는 고정된 사물이나 이미지가 아닌 어떤 발생적 사태(genesis)를 묘사한다. 클레의 노트 『사유하는 눈』(The Thinking Eye)의 첫 페이지에서 곧바로 우리는 회색 점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우주발생(cosmogenesis) 또는 존재발생(ontogenesis)의 언어를 접하게 된다. 이 회색 점은 우주의 시작이자 그의 그림의 모티브이기도 하다. 그것은 존재와 무 사이에 있기 때문에 파란색이나 빨간색 점도 아니고 검은색이나 흰색 점도 아닌 것이다. 그것은 점일 뿐만 아니라 알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형태의 생산을 향해 나아가는 두 개의 상호작용적 힘, 혹은 더 낫게 말해 형태발생(morphogenesis)을 이끄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클레가 관심을 기울인 것인 형태와 상이 아니라, 형태형성(formation[구성])의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이것이 그가 그의 Gestalt[형태] 이론을 <114>‘형태의 가르침’(Formlehre)가 아니라 ‘형태성성의 가르침’(Formungslehre)이라고 부른 이유이다. 이 형태형성은 회색 점에서 시작하여 흑과 백의 두 가지 상반된 움직임과 힘을 체현한다.
이 ‘비-개념’을 위한 회화적 상징은 실제로는 점이 아닌 점, 즉 수학적 점이다. 어디에도-존재하지-않는 어떤 것 또는 어딘가에-존재하는 무는 대립으로부터 자유로운 비-개념적 개념이다. 이를 지각 가능한 것과 관련하여 표현하면(마치 카오스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것처럼), 우리는 회색이라는 개념에, 즉 존재로-도래하는 것과 지나가 버리는 것 사이의 숙명적 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 점은 흰색도 검은색도 아니거나 흰색과 검은색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회색이다... 이것은 위도 아래도 아니거나 위와 아래 모두이기 때문에 회색이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기 때문에 회색이다. 또한 어떤 비-차원적 점, 차원들 사이의 점이기 때문에 회색이다.[74]
클레의 회색점은 선이나 면이 아니라 어떤 우주발생(cosmogenesis)이 그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최소한의 표면이다. 그것은 ‘대립으로부터 자유로운 비-개념적 개념’이다. 대립 없는 자유는 없고, 대항-개념 없는 개념도 없으므로, 그러한 발생은 오로지 대립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에서 클레는 “어떤 한 점에 중심으로서의 중요성이 주어질 때, 바로 이때가 우주발생의 순간이다. 이 발생에는 모든 종류의 시작(예컨대 출산)에 대한 관념 또는 더 낫게 말한다면 알의 개념이 상응한다”라고 부가한다. 클레는 이 지점이 확립되면 회색점은 “다른 질서 영역으로 도약”한다고 언급했다.
중국학자라면 다음과 같이 물을 것이다. 이것은 음(yin)과 양(yang)이 아닌가? 클레가 동양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대립이란 시작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명(resonance)은 분명히 클레 자신의 상상력과 힘에 대한 해석에 속한다. 힘들의 전개와 그것들 사이의 관계는 해석에 속하는 문제다. 이보다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115>클레가 우주 발생으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는 자신의 시대의 우주발생론, 즉 열역학에서 시작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러한 우주발생은 어느 정도까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으로 허용되는가?
필연성에 대한 질문 - Must es sein? - 은 어떤 예술가 그 혹은 그녀가 우발성에 사로잡혀 있다며, 아마도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다. 바우하우스 동료였던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처럼 구상 회화를 극복하고자 했던 클레의 동시대 작가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현상학자 미셸 앙리(Michel Henry)에 따르면 칸딘스키는 구상 회화에 반대했다. 추상 회화는 점, 선, 면, 색이라는 회화의 요소를 재조직화함으로써 회화성(the pictorial)을 드려내려는 시도이다. 모든 화가는 점, 선, 면으로 작업해야 하지만 추상 회화의 회화적 조직화는 구상을 드러내지 않는 요소의 사용도 합리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칸딘스키에서 우리는 색이 객관적인 의미에서 형태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신 색은 공간으로부터 해방되어 리드미컬하거나 심지어 음악적이 된다. 회화에 형상적 표현을 넘어서는 화가는 자기 자신의 형태론을 필연적으로 정당화해야 한다.[75]
예술과 비교하면 과학은 필연성에서 출발한다. 과학의 대상인 자연 법칙은 법칙이라고 부르기 전에 반드시 필연적이어야 한다. 과학적 가설은 증명되기 전에 어떤 것이 필연적이라는 주장이다. 예술은 이와는 다른 성격의 필연성을 주장한다. 예술에서의 필연성은 연역이나 귀납과 같은 이성적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리적인 토대가 있든 없든 합리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예술은 과학에 완전히 기초할 수 없다. 철학과 마찬가지로 예술은 과학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과학을 도식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예술은 <116>과학의 필연성을 우발성으로 만들기 위해, 그와 같은 우발성이 다시 필연성이 되기 전에 과학으로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예술의 이러한 기능은 니체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노발리스(Novalis)에게 있어 과학을 더 높은 영역으로 되돌려주는데, 이는 곧 생명[삶]이다. 여기서 우리는 1872년 판 『비극의 탄생』에 있는 이 발언을 떠올리길 바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년이 지난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책이 얼마나 불쾌하게 느껴지는지, 얼마나 낯설게 느껴지는지 - 더 늙고 백 배 더 까다로워졌지만 결코 차갑지 않은 눈, 대담한 책이 처음으로 시도한 바로 그 작업, 즉 과학은 예술가의 광학으로 보되 예술은 삶의 광학으로 보려는 작업을 수행할 준비가 충분히 된 눈 앞에서 나는 그러한 느낌을 완전히 억누르고 싶지는 않다.[76]
니체는 과학을 예술 또는 예술적 창조라는 더 넓은 현실로 돌려 놓으며, 더 나아가 예술을 생명[삶]이라는 또 다른 더 넓은 현실로 되돌려 놓는다. 여기서 생명은 생물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존재에 기초하여 생물학적인 것을 우월한 방식으로 파악한 어떤 변형된 해석”을 의미한다.[77] 이 제안은 예술가의 DNA로 인공 유기체를 제작하거나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누군가의 DNA를 해석한 그림을 제작하는 것과 같은 기존의 바이오아트의 기법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과학적 합리주의에 저항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이 새로운 합목적성을 획득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돌아가야 하는 방식으로 과학을 스스로에게 낯선 존재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릴케의 시, 특히 1925년 11월 13일에 쓴 「무조로부터의 서신」(Briefe aus Muzot)에서 같은 동기를 발견할 수 있다. “비가의 천사는 우리가 해 나가고 있는 가시적인 것의 비가시적 변형이 이미 이루어진 존재이다 (...) 비가의 천사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더 높은 차원의 현실 인식을 긍정하는 존재이다.”[78]. 비가시적인 것은 <117>우리가 비-합리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전에 언급했던 더 넒은 실재 또는 실재의 더 높은 차원이다. 헨리가 다음과 같이 쓴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생명을 보이게 만들고자 했던 클레와 칸딘스키의 작품에서도 역전된 방식이기는 해도 비슷한 행위가 발견된다.
예술은 단순히 우리 존재의 이러한 비가시적이고 본질적인 실재성에 관한 이론적 증명이 아니다. 예술은 대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으로서 그것[존재의 비가시적이고 본질적인 실재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한다. 다시 말해 예술은 그것을 실행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확실성을 경험한다. 이 확실성은 우리의 삶/생명과 완전히 일치한다.[79]
(30억 년 전에 시작된) 생물학적 의미의 생명이 예술 없이도 존재했더라도(가장 오래된 선사시대 그림은 약 4만 5천 년 전의 것이다), 삶/생명은 예술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예술은 생명의 표현이고 생명은 예술의 표현이다. 칸딘스키의 추상 회화에서 삶과 예술을 동일시하는 것은 삶을 예술의 내용으로 삼으려는 시도이며, 그것의 내적 필연성은 그의 그림에서 증거를 찾는다. 그러나 직관적으로만 남아있는 이 내적 필연성은 무엇인가? 헨리는 칸딘스키의 생각이 우주에 대한 그의 이해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죽은’ 모든 것이 전율했다. 시인들이 노래하는 별, 달, 숲, 꽃뿐만 아니라 재떨이에 누워 있는 시가 꽁초, 길거리의 웅덩이에서 당신을 올려다보는 인내심 많은 하얀 양복 바지 단추까지 모든 것이 말보다 침묵에 더 자주 기울어진 얼굴, 가장 내밀한 존재, 비밀스러운 영혼을 보여 주었다, 개미의 강한 턱으로 긴 풀을 뚫고 불확실하고 생명력 있는 어떤 끝으로 옮겨지는 순종적인 나무껍질 조각, 의식적으로 뻗은 손에 의해 강제로 찢어진 달력의 한 페이지, 남은 페이지의 따뜻한 동행에서 나온 그 손. 마찬가지로, 모든 정지된 점과 움직이는 점(=선)은 나에게 살아 있는 것처럼 그 영혼을 드러냈다.[80]
<118>예술과 우주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칸딘스키의 ‘쾰른 강연’에서 “예술 작품의 탄생은 우주적 성격이 있다”고 말한 것을 떠올리면 더욱 분명해진다. 즉, 칸딘스키는 19세기 갈릴레이적 자연 유산에 저항하는 또 다른 우주를 그리고자 했다. 이 모티브는 정확한 과학에서 시작하지 않고 직관으로 시작하기를 원했던 클레와도 공유된다. 비철학적 의미의 직관은 환상, 신비주의, 비합리성 또는 때로는 단순한 소음과 같은 검증되지 않은 지각과 같으며 헤겔 정신이 절대자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한계이기 때문에 직관의 개념은 여기서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적 갈등을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원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직관을 통해서만 작가는 ‘개량된 카메라’가 아니라, 클레가 「자연을 연구하는 방법」(1923)에서 말한 것처럼 “더 복잡하고, 더 풍부하고, 더 넓기 때문에” 형상을 넘어설 수 있다.
예술과 우주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칸딘스키의 ‘쾰른 강연’에서 “예술 작품의 탄생은 우주적의 특성에 속한다”라고 말한 것을 상기하면 더욱 분명해진다.[81] 즉, 칸딘스키는 19세기 말갈릴레이적 자연의 유산에 저항하는 또 다른 우주를 그리고자 한다.[82] 이 모티브는 클레와 공유하는 지점이다. 클레는 정밀과학(exact science)이 아니라, 직관으로 시작하고자 했다. 직관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비지성적인 것으로 남아있다. 왜냐하면 비철학적 의미에서의 직관은 검증되지 않은 지각 - 환상, 신비주의, 비합리성 또는 때로는 단순한 소음 -과 같을 뿐 아니라, 헤겔 정신이 절대자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한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 갈등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원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노트』에서 클레의 방법은 정확성에 대한 탐구(즉, 수학적 기초를 가진 과학)와 직관을 결합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직관 안에 정확성에 대한 연구를 새겨 넣으면 발생[기원]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확성은 본질적으로 기하학적이기 때문에 정확성 추구만으로는 발생[기원]을 제시할 수 없다. 정확성은 생명과 존재의 한 차원일 뿐이다. 기하학적 형태는 정적이든 동적이든(재귀적 형태에서처럼) 우리에게 형태(Gestalt)를 줄 수 있지만 반드시 발생[기원]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발생[기원]에 대한 이해는 기하학적 지식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쉴러(Schiller)가 형식적 욕구(합리성)와 물질적 욕구(감각)를 놀이 욕구(예술)를 통해 조화시킨 것처럼 예술에서는 정확성과 부정확성이 조화를 이룬다. 클레는 정확성 속으로 부정확성을 부가하는 모욕을 예상한다. 그는 “그리고 그 모욕은 우박처럼 떨어질 것이다. 낭만주의! 우주론! 신비주의! 결국 우리는 어떤 철학자, 어떤 마술사를 불러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클레는 현대 과학에 내재된 대립, 즉 직관과 정확성 사이의 대립을 지적한다. 만약 연구의 정확성이 필연적으로 직관을 침식한다면 클레는 직관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클레가 「자연을 연구하는 방법」(Ways to Study Nature, 1923)에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직관이 있어야만 예술가는 ‘개량된 카메라’가 아니라, “더 복잡하고 <119> 풍부하고 더 넓으므로 형태[형상]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 그는 대지 위의 피조물이자 전체 내부의 피조물, 다시 말해 여러 별 가운데 하나의 별에 있는 피조물이다.” 이 글에서 클레가 사용하는 말들은 하이데거가 세계와 대지의 도식을 제시할 때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그 의미와 동력학은 다르다. 클레의 도식에서 시각은 비-광학적인 우주적 공동체와 비-광학적인 대지적 뿌리라는 두 극을 우회하여 두 가지 다른 과정을 거쳐 나간다.
아래로부터 예술가의 눈에 도달하는 바, 대지적 결속(earthbound)으로서의 물리적 접촉이라는 비-광학적 방식이 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우주적 결속(cosmicbond)을 통한 비-광학적 접촉이 있다. 강도적 연구(intensive study)는 우리가 말했던 과정을 집중시키고 단순화하는 경험을 이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83]
예술가가 미지의 세계와의 공동 창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광학적 시각 방식을 뛰어넘어 형이상학 - 존재를 그 자체로, 전체로서 파악하려는 시도 - 너머로 가야 한다. 이 과정은 기하학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생명력의 끊임없는 흐름을 감지하는 ‘보는’ 방식을 재발명한다. 이렇게 제시된 대상은 더 이상 카메라에 의해 정지되거나 포착된 대상이 아니며, 이는 주로 감각적인 것에서 실재를 해방하고 감각적인 것을 실재로 확인하는 변형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직관에 대한 클레의 담론은 직관이 기하학을 지속에 통합함으로써 기하학을 해체하는 베르그송의 담론과 연관시킬 수 있다. 여기서 직관은 지성의 경직성에 도전하고 그것을 해체하며, 더 정확하게는 지성을 기하학화하려는 경향을 역전시켜 지성이 형식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방시킨다. 베르그송에게 직관은 신비롭거나 모호한 것이 아니라 질 들뢰즈가 올바르게 지적한 것처럼 정확한 철학적 방법이다.
<120>이러한 [인식의] 되돌림(undoing)은 어떤 개방을 창조한다. 여기에는 주로 문제 제기, 의심, 모순, 화해, 도약, 극복이 포함된다. 감각의 정지를 통해 클레는 우주가 자신을 관통하고 자신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재구성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회화는 시각적 요소를 추가하기 때문에 음악보다 더 리드미컬하다. 그것은 움직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어떤 모방보다 더 시각적이다.[85] 하이데거에게 세잔과 클레의 그림은 입체파처럼 왜곡된 재현이나 형태를 넘어 재현으로서의 세계에 도전하는 구멍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베르그송은 다음과 같이 묻는다. “직관과 과학 사이에 어떻게 부조화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직관이 본능과 같은 것이라면 어떻게 과학이 우리의 직관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86]
직관과 지성[지능]은 직관이 과학적으로 연구된 사실과 접촉함으로써 더 정확해지기를 거부하는 경우와 지성이 과학에 적합한 것(즉, 사실로부터 추론하거나 추론에 의해 증명할 수 있는 것)에 자신을 한정하는 대신, 과학적 가식을 헛되게 주장하는 무의식적이고 일관성 없는 형이상학을 이것과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87]
직관은 지능이나 이성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직관과 지능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직관’이라는 용어는 절대적인 증거 없이 단순히 추측하는 것 이상을 포함하므로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대신 직관과 지능의 관계를 배경과 전경, 예술, 과학과 유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기술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서, 질베르 시몽동은 베르그송을 따라 기술 결정론과 어떤 강한 긴장을 형성하는 기술성의 발생을 이해하기 위해 <121>‘철학적 직관’을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했다. 시몽동은 철학적 직관을 개념 및 관념과 병치시킨다. 개념은 선험적이고 초월적이며 연역적인 것을 의미하는 반면, 관념은 사후적이고 경험적이며 귀납적인 것을 뜻한다. 직관은 연역적이지도 귀납적이지도 않고, 초월적이지도 경험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발생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시몽동은 기술 대상의 구체화(예컨대 그것들의 유기화)와 인간과 기술적 대상의 관계에 대한 단순한 분석만으로는 기술성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우리는 종교, 미학, 철학 등 다른 형태의 사고와 관련하여 기술성의 발생을 이해해야 한다.[88] 기술을 발생으로 설정하려면 관념이나 개념에 의존하지 않는 ‘철학적 직관’이 필요요구되며, 배경과 전경 사이의 상호성에 따라 특성화되는 어떤 과정을 재구성하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클레의 그림은 이를 구체화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우리 자신의 질문에 완전히 답하지 못했다. 즉 이 접근법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12. 미지의 것에 관한 인식론
예술 작품은 말한다. 그것은 작품에 의해 환기되는 감성과 일치하는 어떤 공동체, 즉 민중에게 말을 건넨다. 이러한 감성은 특정 국가에 속할 필요는 없지만, (발터 벤야민의 의미에서) 정치의 미학화를 기반으로 한 국민-국가의 닦달[틀짓기] 때문에 종종 그렇게 된다. 근거 또는 배경으로서의 직관은 특정 문화 및 미감적 교육에 의해 그 자체의 관점에 의해 제한된다. 일본 문화에서 자랐고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독일 문화에서 자란 사람과 다른 직관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각각 다른 <122>감성을 배양하기 때문이다. 감성은 직관적이며, 직관은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로고스 중심주의와 음성 중심주의에 의해 항상 무시되고 약화된다. 공동체는 근친관계를 통해 형성되지만 그 기반은 어떤 공유된 감성에 있다. 사회적 관계가 완전히 지도화되고 수치로 환원할 수 없는 한, 공동체는 계산 가능성보다는 감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우정은 계산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감성을 선험적인 범주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감성은 삶의 ‘내적 필연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신장되고 환기되어야 힌다. 감성은 감각적인 것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감각적인 것의 총합과 같지 않다. 예술 작품은 대화(dia와 logos)로서의 어떤 일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변조한다. 일치란 A=A 또는 A=B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작품 속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예술 작품을 공동체의 삶 속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때로는 다다이스트와 초현실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일치란 고정관념이나 억압된 감성을 깨뜨리기 위해 환기된다.
하이데거에게 예술 작품은 그리스 비극에서처럼 긴장이나 심지어 모순을 통해 말하려는 세계와 대지 사이의 투쟁을 보여준다. 그리스 비극의 관객은 이야기의 줄거리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비극을 동일시한다. 자크 타미아노가 지적한 것처럼, 공동체인 한 세계는 항상 단독적이며 “결코 어떤 이-그리고-모든 이의 세계, 보편적 인류의 세계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 타미아노는 하이데거의 말을 인용하여 “한 민족을 위한 세계, 그 민족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말한다.[89] 세계는 그러한 투쟁이 감지되는 감성을 공유하는 민족에게 속하기 때문에 보편적이지 않다. 우리는 중국 예술에서 상이한 진리 개념과 진리에 대한 상이한 접근 방식 때문에 그와 같은 역동성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반 고흐의 그림은 다양한 전거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국경과 인종이 아니라, 언어와 관습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성으로 정의되는 민족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런 예술 작품이 <123>어떤 것을 말하고자 한다면 과연 무엇을 말하고길 원하는가?
예술 작품이 사람들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술 작품은 진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진리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18-19세기 서양 예술에서는 이 진리는 ‘아름다움’, 다다이스트와 초현실주의 이후 백 년 동안은 ‘숭고’라고 불려졌다. 어떤 진리가 기하학처럼 증명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참이기 때문에 선험적 진리이다. 1+1=2 또는 직삼각형의 두 변의 제곱의 합은 세 번째 변의 제곱과 같다는 것과 같은 이성적 진리라고 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없는 진리도 있지만, 그렇다고 비진리라고 판단될 수 없는 진리도 있다. 종교인에게는 신이 진리이지만 신의 존재를 성공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화가에게는 아름다운 것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그림에 묘사된 어떤 대상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우리는 이것을 비-합리적인 것(non-rational)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비이성적인 것(the irrational)과 합리적인 것(the rational) 모두와 구별되어야 한다. 비이성적인 것은 합리적인 것과 적대적이다. 비이성적인 것은 거짓으로 입증될 수 있지만 비-합리적인 것은 입증의 영역을 넘어선다. 시에서 비-합리적인 것은 언어의 파격적이고 심지어 모순적인 사용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 언어의 유희는 미지의 것(Unbekannte)이 드러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열어준다. 시인은 미지의 존재를 불러내는 사람이다. 코스모테크닉스로서의 예술은 하이데거가 때때로 미지의 것, 헤아릴 수 없는 것, 또는 최후의 신이라고 부르는 비-합리적인 것에 대한 인식론에 기초한다. 따라서 비-합리적인 것은 합리적인 것(the rational) 또는 비이성적인 것(the irrational)과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에 비이원론적이다. 그것은 현상적 진리를 넘어서는 세 번째 항이다.
인식론은 지식의 과학이지만 (라이프니츠가 ‘내가 모르는 무엇’je ne sais quoi처럼) 비-합리적인 것은 그와 같은 것으로는 알 수 없다. 현대 과학과 달리 비-힙리적인 진리는 기하학을 통해 증명할 수도 없고 숫자나 확률로 나타낼 수도 없다. 알렉산더 바움가르텐(Alexander Baumgarten)이 합리주의 철학에 ‘내가 모르는 무엇’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공감을 불러일으키지만, 그것은 우리의 접근 방식과는 다르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지의 것에 대한 인식론이 가능할 수 있는가? 인식론은 어떤 근거[배경]를 요청하지만, 비-합리적인 것에서 출발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은 없다. 유일한 시작은 자명하지 않고 드러나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근거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에서 비롯될 수 있다.
<124>이 근거는 어느 정도까지 우연적이거나 자의적이지 않은가? 과학은 입증 가능한 근거에서 출발하는 반면, 예술은 근거 없는 근거에서 출발하여 개방성과 측정 불가능성을 옹호한다. 현대 과학도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생명의 신비한 기원 등과 같은 많은 미지의 요소를 다루어야 하지만 여전히 수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수학적 일관성은 과학에서 실재의 기준이지만, 철학과 예술에서 수학적 일관성은 시작도 끝도 아니다. 칸트의 철학에 관한 재구성에 따르면, 아름다운 것과 도덕적인 것은 수학적 개념처럼 증명될 수 없다. 아름다운 것은 ‘목적 없는 목적성’, ‘무관심의 쾌락’과 같이 부정적으로만 정의될 수 있다.
우리가 예술은 비-합리적인 것에 대한 인식론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술이 현상적인 세계와 형태[형상]의 세계에 종속된 궁극적인 실재를 넘어서고자 하는 의지, 즉 플라톤 이래로 형이상학이라고 불려온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니체의 ‘예술로서의 힘에의 의지’를 떠올리게 하는 이러한 힘에의 의지는 예술에 단순한 모방을 넘어선 창조적 힘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한다. 니체에게 있어 황홀경(또는 취함, Rausch)은 예술의 근본적인 요소인데, 황홀경은 주로 저 너머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예술가는 신비롭지도 신화적이지도 않지만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비-합리적인 것과 관련하여 항상 자신의 외부에 있으며, 항구적인 엑스터시 상태에 있다. 이는 감각적인 것을 통해 초감각적인 것에 도달하는 앎의 방식, 즉 니체 자신이 말한 바, 니체적 반플라톤주의를 함축한다.
나 자신과 청교도적 양심의 불안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 그리고 살아가도록 허락된 모든 사람들 - 을 위해, 나는 감각의 더욱 더 커다란 영성화와 증강을 기원한다. 그렇다, 우리는 감각의 미묘함, 충만함, 힘에 대해 우리의 감각에 감사해야 하며, 우리가 가진 최고의 정신을 감각에 대가로 제공해야 한다.[90]
<125>감각의 증강(augmentation of the senses)은 예술 작품에 의해 가능해지는데, 이는 반드시 (종종 양적 영역에서 출발하고 그로부터 거의 벗어나지 않는) 가상 현실이나 증강 현실의 형태가 아니라 숭고한 예술에서 비범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 주체를 고양시키거나 주체를 존재도 무도 아닌 위치에 용해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관객은 감탄사로만 반응할 수 있다! 비-합리적인 것이 관객의 경험과 일치하고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예술을 통해서이다. 비-합리적인 것은 특유한 방식과 리듬으로만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와 고대 중국의 미적 경험은 둘 다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지칭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세잔과 클레에 대한 하이데거의 매혹은 형이상학 이후의 세계에서 비-합리적인 것의 자리를 찾으려는 그들의 노력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가? 포스트-형이상학의 의미에서, 신은 모든 존재자로부터 돌아섰다. 존재-신학은 허무주의로 완성되고 표현된다. 즉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신과 같은 최고의 가치도 무가치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 포스트-형이상학의 세계에서 초월적이 것은 어두운 밤 속으로 가라앉는다. 신은 야상곡 안으로 사라지고 종교의 규범적 힘은 현대 국가의 통치 수단이 된다. 신을 대체하기 위한 탐색은 원시 예술, 마약, 맑스주의적 영웅 숭배, 종교와 민족주의의 부흥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시대에도 미지의 것은 여전히 존재한다. 합리화에 대한 낭만주의의 저항이 근대성 내부의 적대를 특징지었다면, 오늘날, 단순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현대 기술의 거대함에 대항할 수 없다.
우리는 아직 우리 시대에 이러저러한 비-인간에 대한 지식과 감성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미지의 존재를 탈신비화하고 탈-인간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못했다. 포스트-형이상학의 세계는 더 이상 상상력을 플라톤의 형상[이데아]이나 기독교의 신처럼 잘 정의되고 명료한 초월에 국한시키지 않으며, 상상력을 원시적인 야생으로 되돌리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그러한 세계는 기술과 더불어 그리고 그것을 통해 <126>새로운 합리화를 확립한다. 이 새로운 합리화는 테크노-로고스(techno-logos)나 ‘서구적 합리성’에 국한되지 않고, 기술을 더 넓은 현실에 재정위함으로써 기술의 근거를 재-근거화[재-배경화]한다.
잃어버린 정신을 찾는 것은 존재 질문의 무지와 망각에 대한 치료법으로 기술 세계에 대립하는 반작용으로 남아 있다. 도구적 합리성의 냉정함과 잔인함을 보상하려는 시도는 불행한 의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대항 세력을 찾았다고 믿을 때마다 항상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처럼 그것의 실종은 변화무쌍하고 지배를 위해 위협하는 타자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실존은 근거[배경]를 잃게 된다. 이를 해결을 위해서는 위치의 조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재-배치(re-configuration)가 필요하다. 하이데거도 존재 물음이 기술과 무관하다면 그의 철학이 실패한 주인-노예 변증법의 희생양이 되어 불행한 의식을 갖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한 가지 가능한 대답은 「예술 작품의 근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존재와 기술이 분리될 수 없다는 존재 물음을 기술에서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예술 작품의 근원」과 「기술에 관한 물음」에서 모두 존재의 은폐가 테크네의 과제와 가능성에 속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어 테크네로부터의 격절로 제시된 현대 기술은 여전히 탈은폐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탈은폐의 방식은 도발적(Herausforderung)이다. 도발은 아무리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더라도 단순한 폐쇄를 의미하지 않는다. 현대인에게는 도발이 하나의 가능성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은폐 방식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붕괴나 최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과 같은 대규모 파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재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우주론, 세잔과 클레에 대한 하이데거의 관심을 Hervorbringen으로 ‘귀환’하는 기술의 미래에 대한 성찰의 시도로 읽어볼 것을 제안하는 이유이다. 비-합리적인 것은 자연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한 앎에 있어서 세잔의 의심과 형이상학에서 벗어나려는 클레의 노력에서 표명된다. 사이버네틱스 이후의 현대 기술도 Hervorbringen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가? 이는 <127>그리스적 테크네로 돌아가거나 디지털 기술로 예술을 만드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도전이 아닌 것으로서의 탈은폐의 방식을 생각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이데거가 클레와 세잔을 그리스인들이 poiesis 또는 Hervorbringen이라고 부르는 것과 연관시킨 것은 존재(Sein)라고 불리우는 비-합리적인 것을 중심으로 한 우주론으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다. 철학의 근본적인 물음으로 제기된 이 물러남은 사유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므로, 하이데거에게 “물러남은 세계 문명 앞에서 사유의 감내, 그것으로부터의 거리두기이다. 이것은 결코 그것의 부정이 아니라 서구 사유의 시작에서 여전히 사유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야 했던 것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91] 하이데거는 「사유는 무엇으로 불리워지는가?」에서 파르메니데스의 단편 6을 상술하면서 “ἑὸν ἔμμεναι[존재함에 대해]를 라틴어나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은 사실상 불필요하다. 그러나 이 말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것은 결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92]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기술의 문제를 사유하기 위해서는 유럽인들이 그리스인보다 더 그리스적이어야 하고, 진보와 퇴보를 모두 극복하여 문화의 재형성을 상상해야 하며(이런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니체의 계승자이다), 하이데거 자신의 말을 빌리면 전위(transposition)와 도약으로서의 번역(Übersetzen)이 요구된다.[93]
<128>또 다른 시작은 예술과 기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만 생각할 수 있다. 하이데거는 고대 그리스 철학을 우회하고 재해석하여 생각하지 않은 것에 숨겨진 탈출구를 찾음으로써 유럽의 근대성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예술 작품의 근원에 관한 비유럽적 사고란 무엇인가? 고대 그리스인을 통한 우회가 비유럽인에게 충분하고 효과적인가? 하이데거가 철학의 종말은 ‘서유럽 사상에 기반한 세계 문명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썼을 때 잘 알았듯이 그리스는 다른 많은 문명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철학의 종말은 사고의 다양화에 대한 긴급한 요구이며, 이 책의 뒷부분에서 나는 이를 파편화(fragmentation)라고 부른다. 파편화는 자연주의자들이 동물과 식물을 분류했던 방식으로 사고를 분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파편화는 사유의 재구성(recomposition of thinking)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다.